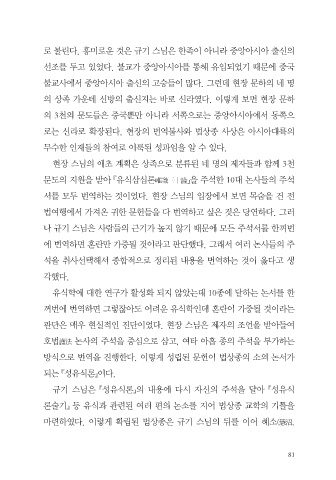Page 83 - 고경 - 2019년 9월호 Vol. 77
P. 83
로 불린다. 흥미로운 것은 규기 스님은 한족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출신의
선조를 두고 있었다. 불교가 중앙아시아를 통해 유입되었기 때문에 중국
불교사에서 중앙아시아 출신의 고승들이 많다. 그런데 현장 문하의 네 명
의 상족 가운데 신방의 출신지는 바로 신라였다. 이렇게 보면 현장 문하
의 3천의 문도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에서 동쪽으
로는 신라로 확장된다. 현장의 번역불사와 법상종 사상은 아시아대륙의
무수한 인재들의 참여로 이룩된 성과임을 알 수 있다.
현장 스님의 애초 계획은 상족으로 분류된 네 명의 제자들과 함께 3천
문도의 지원을 받아 『유식삼십론唯識三十論』을 주석한 10대 논사들의 주석
서를 모두 번역하는 것이었다. 현장 스님의 입장에서 보면 목숨을 건 전
법여행에서 가져온 귀한 문헌들을 다 번역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
나 규기 스님은 사람들의 근기가 높지 않기 때문에 모든 주석서를 한꺼번
에 번역하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여러 논사들의 주
석을 취사선택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
각했다.
유식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지 않았는데 10종에 달하는 논서를 한
꺼번에 번역하면 그렇잖아도 어려운 유식학인데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판단은 매우 현실적인 진단이었다. 현장 스님은 제자의 조언을 받아들여
호법護法 논사의 주석을 중심으로 삼고, 여타 아홉 종의 주석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번역을 진행한다. 이렇게 성립된 문헌이 법상종의 소의 논서가
되는 『성유식론』이다.
규기 스님은 『성유식론』의 내용에 다시 자신의 주석을 달아 『성유식
론술기』 등 유식과 관련된 여러 편의 논소를 지어 법상종 교학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확립된 법상종은 규기 스님의 뒤를 이어 혜소(慧沼,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