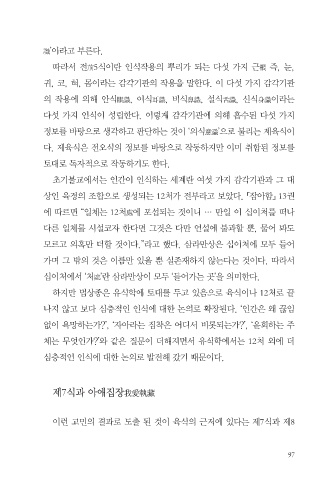Page 99 - 고경 - 2019년 11월호 Vol. 79
P. 99
識’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전前5식이란 인식작용의 뿌리가 되는 다섯 가지 근根 즉,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감각기관의 작용을 말한다. 이 다섯 가지 감각기관
의 작용에 의해 안식眼識, 이식耳識, 비식鼻識, 설식舌識, 신식身識이라는
다섯 가지 인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감각기관에 의해 흡수된 다섯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의식意識’으로 불리는 제육식이
다. 제육식은 전오식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동하지만 이미 취합된 정보를
토대로 독자적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초기불교에서는 인간이 인식하는 세계란 여섯 가지 감각기관과 그 대
상인 육경의 조합으로 생성되는 12처가 전부라고 보았다. 『잡아함』 13권
에 따르면 “일체는 12처處에 포섭되는 것이니 … 만일 이 십이처를 떠나
다른 일체를 시설코자 한다면 그것은 다만 언설에 불과할 뿐, 물어 봐도
모르고 의혹만 더할 것이다.”라고 했다. 삼라만상은 십이처에 모두 들어
가며 그 밖의 것은 이름만 있을 뿐 실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십이처에서 ‘처處’란 삼라만상이 모두 ‘들어가는 곳’을 의미한다.
하지만 법상종은 유식학에 토대를 두고 있음으로 육식이나 12처로 끝
나지 않고 보다 심층적인 인식에 대한 논의로 확장된다. ‘인간은 왜 끊임
없이 욕망하는가?’, ‘자아라는 집착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윤회하는 주
체는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이 더해지면서 유식학에서는 12처 외에 더
심층적인 인식에 대한 논의로 발전해 갔기 때문이다.
제7식과 아애집장我愛執藏
이런 고민의 결과로 도출 된 것이 육식의 근저에 있다는 제7식과 제8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