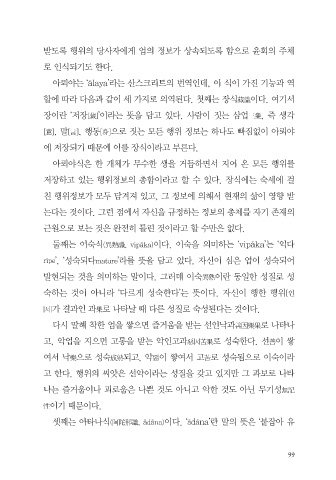Page 101 - 고경 - 2019년 11월호 Vol. 79
P. 101
받도록 행위의 당사자에게 업의 정보가 상속되도록 함으로 윤회의 주체
로 인식되기도 한다.
아뢰야는 ‘ālaya’라는 산스크리트의 번역인데, 이 식이 가진 기능과 역
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의역된다. 첫째는 장식藏識이다. 여기서
장이란 ‘저장[藏]’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사람이 짓는 삼업三業, 즉 생각
[意], 말[言], 행동[身]으로 짓는 모든 행위 정보는 하나도 빠짐없이 아뢰야
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를 장식이라고 부른다.
아뢰야식은 한 개체가 무수한 생을 거듭하면서 지어 온 모든 행위를
저장하고 있는 행위정보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장식에는 숙세에 걸
친 행위정보가 모두 담겨져 있고, 그 정보에 의해서 현재의 삶이 영향 받
는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신을 규정하는 정보의 총체를 자기 존재의
근원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둘째는 이숙식(異熟識, vipāka)이다. 이숙을 의미하는 ‘vipāka’는 ‘익다
ripe’, ‘성숙되다mature’라를 뜻을 담고 있다. 자신이 심은 업이 성숙되어
발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러데 이숙異熟이란 동일한 성질로 성
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성숙한다’는 뜻이다. 자신이 행한 행위[인
因]가 결과인 과果로 나타날 때 다른 성질로 숙성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착한 업을 쌓으면 즐거움을 받는 선인낙과善因樂果로 나타나
고, 악업을 지으면 고통을 받는 악인고과惡因苦果로 성숙한다. 선善이 쌓
여서 낙樂으로 성숙成熟되고, 악惡이 쌓여서 고苦로 성숙됨으로 이숙이라
고 한다. 행위의 씨앗은 선악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지만 그 과보로 나타
나는 즐거움이나 괴로움은 나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 무기성無記
性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아타나식(阿陀那識, ādāna)이다. ‘ādāna’란 말의 뜻은 ‘붙잡아 유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