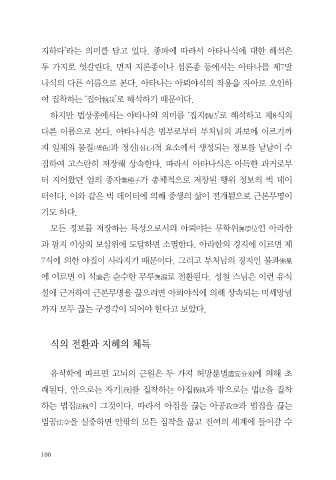Page 102 - 고경 - 2019년 11월호 Vol. 79
P. 102
지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종파에 따라서 아타나식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엇갈린다. 먼저 지론종이나 섭론종 등에서는 아타나를 제7말
나식의 다른 이름으로 본다. 아타나는 아뢰야식의 작용을 자아로 오인하
여 집착하는 ‘집아執我’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상종에서는 아타나의 의미를 ‘집지執持’로 해석하고 제8식의
다른 이름으로 본다. 아타나식은 범부로부터 부처님의 과보에 이르기까
지 일체의 물질[색色]과 정신[심心]적 요소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낱낱이 수
집하여 고스란히 저장해 상속한다. 따라서 아타나식은 아득한 과거로부
터 지어왔던 업의 종자業種子가 총체적으로 저장된 행위 정보의 빅 데이
터이다. 이와 같은 빅 데이터에 의해 중생의 삶이 전개됨으로 근본무명이
기도 하다.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특성으로서의 아뢰야는 무학위無學位인 아라한
과 팔지 이상의 보살위에 도달하면 소멸한다.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면 제
7식에 의한 아집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경지인 불과佛果
에 이르면 이 식識은 순수한 무루無漏로 전환된다. 성철 스님은 이런 유식
설에 근거하여 근본무명을 끊으려면 아뢰야식에 의해 상속되는 미세망념
까지 모두 끊는 구경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식의 전환과 지혜의 체득
유식학에 따르면 고뇌의 근원은 두 가지 허망분별虛妄分別에 의해 초
래된다. 안으로는 자기[我]를 집착하는 아집我執과 밖으로는 법法을 집착
하는 법집法執이 그것이다. 따라서 아집을 끊는 아공我空과 법집을 끊는
법공法空을 실증하면 안팎의 모든 집착을 끊고 진여의 세계에 들어갈 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