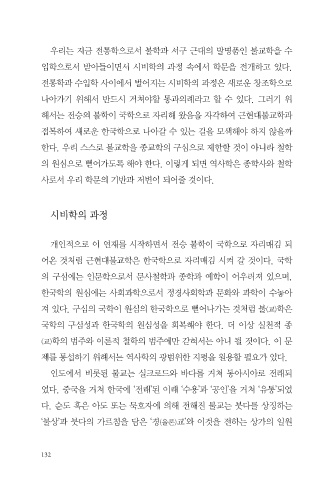Page 134 - 고경 - 2020년 1월호 Vol. 81
P. 134
우리는 지금 전통학으로서 불학과 서구 근대의 발명품인 불교학을 수
입학으로서 받아들이면서 시비학의 과정 속에서 학문을 전개하고 있다.
전통학과 수입학 사이에서 벌어지는 시비학의 과정은 새로운 창조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할 통과의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
해서는 전승의 불학이 국학으로 자리해 왔음을 자각하여 근현대불교학과
접목하여 새로운 한국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우리 스스로 불교학을 종교학의 구심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철학
의 원심으로 뻗어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역사학은 종학사와 철학
사로서 우리 학문의 기반과 저변이 되어줄 것이다.
시비학의 과정
개인적으로 이 연재를 시작하면서 전승 불학이 국학으로 자리매김 되
어온 것처럼 근현대불교학은 한국학으로 자리매김 시켜 갈 것이다. 국학
의 구심에는 인문학으로서 문사철학과 종학과 예학이 어우러져 있으며,
한국학의 원심에는 사회과학으로서 정경사회학과 문화와 과학이 수놓아
져 있다. 구심의 국학이 원심의 한국학으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불(교)학은
국학의 구심성과 한국학의 원심성을 회복해야 한다. 더 이상 실천적 종
(교)학의 범주와 이론적 철학의 범주에만 갇혀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 문
제를 통섭하기 위해서는 역사학의 광범위한 지평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
인도에서 비롯된 불교는 실크로드와 바다를 거쳐 동아시아로 전래되
었다.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전래’된 이래 ‘수용’과 ‘공인’을 거쳐 ‘유통’되었
다. 순도 혹은 아도 또는 묵호자에 의해 전해진 불교는 붓다를 상징하는
‘불상’과 붓다의 가르침을 담은 ‘경(율론)교’와 이것을 전하는 상가의 일원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