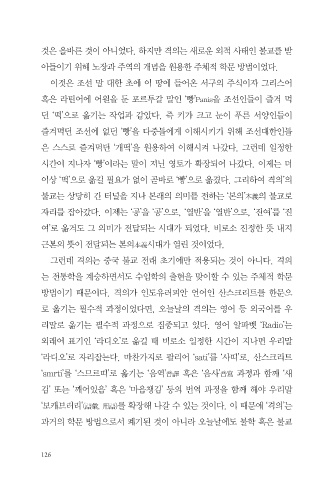Page 128 - 고경 - 2020년 2월호 Vol. 82
P. 128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격의는 새로운 외적 사태인 불교를 받
아들이기 위해 노장과 주역의 개념을 원용한 주체적 학문 방법이었다.
이것은 조선 말 대한 초에 이 땅에 들어온 서구의 주식이자 그리스어
혹은 라틴어에 어원을 둔 포르투갈 말인 ‘빵’Panis을 조선인들이 즐겨 먹
던 ‘떡’으로 옮기는 작업과 같았다. 즉 키가 크고 눈이 푸른 서양인들이
즐겨먹던 조선에 없던 ‘빵’을 다중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조선대한인들
은 스스로 즐겨먹던 ‘개떡’을 원용하여 이해시켜 나갔다.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자 ‘빵’이라는 말이 지닌 영토가 확장되어 나갔다. 이제는 더
이상 ‘떡’으로 옮길 필요가 없이 곧바로 ‘빵’으로 옮겼다. 그리하여 격의’의
불교는 상당히 긴 터널을 지나 본래의 의미를 전하는 ‘본의’本義의 불교로
자리를 잡아갔다. 이제는 ‘공’을 ‘공’으로, ‘열반’을 ‘열반’으로, ‘진여’를 ‘진
여’로 옮겨도 그 의미가 전달되는 시대가 되었다. 비로소 진정한 뜻 내지
근본의 뜻이 전달되는 본의本義시대가 열린 것이었다.
그런데 격의는 중국 불교 전래 초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격의
는 전통학을 계승하면서도 수입학의 출현을 맞이할 수 있는 주체적 학문
방법이기 때문이다. 격의가 인도유러피안 언어인 산스크리트를 한문으
로 옮기는 필수적 과정이었다면, 오늘날의 격의는 영어 등 외국어를 우
리말로 옮기는 필수적 과정으로 집중되고 있다. 영어 알파벳 ‘Radio’는
외래어 표기인 ‘라디오’로 옮길 때 비로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말
‘라디오’로 자리잡는다. 마찬가지로 팔리어 ‘sati’를 ‘사띠’로, 산스크리트
‘smrti’를 ‘스므르띠’로 옮기는 ‘음역’音譯 혹은 ‘음사’音寫 과정과 함께 ‘새
김’ 또는 ‘깨어있음’ 혹은 ‘마음챙김’ 등의 번역 과정을 함께 해야 우리말
‘보캐브러리’(語彙, 用語)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격의’는
과거의 학문 방법으로서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불학 혹은 불교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