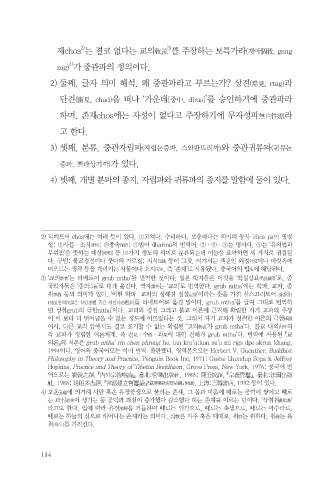Page 116 - 고경 - 2020년 4월호 Vol. 84
P. 116
2) 3)
재chos 는 결코 없다는 교의敎義 를 주장하는 보특가라(개아個我, gang
4)
zag) 가 중관파의 정의이다.
2) 둘째, 글자 의미 해석. 왜 중관파라고 부르는가? 상견(常見, rtag)과
단견(斷見, chad)을 떠나 ‘가운데[중中, dbus]’를 승인하기에 중관파라
하며, 존재chos에는 자성이 없다고 주장하기에 무자성파無自性派라
고 한다.
3) 셋째, 분류. 중관자립파(자립논증파, 스와딴뜨리까)와 중관귀류파(귀류논
증파, 쁘라상기까)가 있다.
4) 넷째, 개별 분파의 종지. 자립파와 귀류파의 종지를 말함에 둘이 있다.
2) 티베트어 chos에는 여러 뜻이 있다. ①고치다, 수리하다, 보충하다는 의미의 동사 ’chos pa이 명령
형; ②사물·소지所知; ③풍속風俗; ④범어 dharma의 번역어. ②·③·④는 명사다. ④는 ‘유의법과
무위법’을 뜻하는 대상[所知] 등 10가지 정도의 의미로 분류되는데 이들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귀결된
다. 규범; 불교경전이나 붓다의 가르침; 지식知識 등이 그것. 여기서는 객관인 외경外境이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등을 가리키는 사물이나 소지所知, 즉 ‘존재’로 사용됐다. 중국어의 법法에 해당된다.
‘
3) 교의敎義’는 티베트어 grub mtha’를 번역한 것이다. 일본 학자들은 이것을 ‘학설강요學說綱要’로, 중
국학자들은 ‘종의宗義’로 대개 옮긴다. 역자譯者는 ‘교의’로 번역한다. grub mtha’에는 학파, 교파, 종
취宗趣 등의 의미가 있다. ‘어떤 학파 교파의 정해진 정설定說’이라는 뜻을 가진 산스끄리트어 siddh
nta[한역漢譯은 실단悉檀 혹은 실단다悉檀多]를 티베트어로 옮긴 말이다. grub mtha’를 글자 그대로 번역하
면 성취grub의 극한mtha’이다. 교리와 경전 그리고 불교 이론에 근거해 확립한 자기 교파의 주장
이 이 보다 더 뛰어넘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 그래서 자기 교파가 성취한 이론의 극한極限
이자, 다른 교리 앞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확립된 ‘교의敎義’가 grub mtha’다. 불교 내외內外의
각 교파가 정립한 이론체계, 즉 견見·수修·과果에 대한 견해가 grub mtha’다. 번역에 사용된 『교
의론』의 저본은 grub mtha’ rin chen phreng ba, lan kru’u:kan su’u mi rigs dpe skrun khang,
1994이다. 영어와 중국어로는 이미 번역 출판됐다. 영역본으로는 Herbert V. Guenther, Buddhist
Philosophy in Theory and Practice, Penguin Book Inc, 1971; Geshe Lhundup Sopa & Jeffrey
Hopkins, Practice and Theory of Tibetan Buddhism, Grove Press, New York, 1976; 중국어 번
역으로는 劉銳之譯, 『內外宗敎略論』, 臺北:密乘出版社, 1985; 陳玉蛟譯, 『宗義寶鬘』, 臺北:法爾出版
社, 1988; 班班多杰譯, 『宗派建立寶鬘論』(『藏傳佛敎思想史綱』 附錄), 上海:三聯書店, 1992 등이 있다.
4) 오온五蘊에 의거해 사람 혹은 유정중생으로 불리는 존재, 그 몸과 마음에 때로는 공덕이 쌓이고 때로
는 과실過失이 생기는 등 공덕과 과실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하는 존재를 이르는 단어다. ‘삭취취數取趣’
라고도 한다. 업에 따라 유전流轉을 거듭하며 때로는 인간으로, 때로는 축생으로, 때로는 아수라로,
때로는 하늘의 신으로 태어나는 존재라는 의미다. 삭數은 자주 혹은 때때로, 취取는 취하다, 취趣는 육
취(육도)를 가리킨다.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