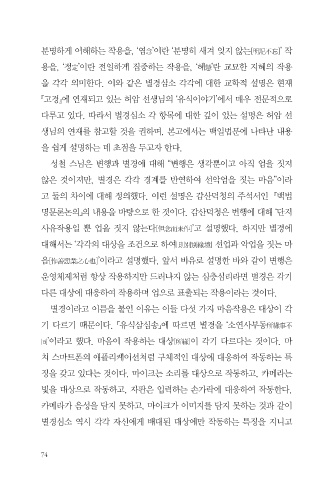Page 76 - 고경 - 2020년 4월호 Vol. 84
P. 76
분명하게 이해하는 작용을, ‘염念’이란 ‘분명히 새겨 잊지 않는[明記不忘]’ 작
용을, ‘정定’이란 전일하게 집중하는 작용을, ‘혜慧’란 교묘한 지혜의 작용
을 각각 의미한다. 이와 같은 별경심소 각각에 대한 교학적 설명은 현재
『고경』에 연재되고 있는 허암 선생님의 ‘유식이야기’에서 매우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별경심소 각 항목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은 허암 선
생님의 연재를 참고할 것을 권하며, 본고에서는 백일법문에 나타난 내용
을 쉽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성철 스님은 변행과 별경에 대해 “변행은 생각뿐이고 아직 업을 짓지
않은 것이지만, 별경은 각각 경계를 반연하여 선악업을 짓는 마음”이라
고 둘의 차이에 대해 정의했다. 이런 설명은 감산덕청의 주석서인 『백법
명문론논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감산덕청은 변행에 대해 ‘단지
사유작용일 뿐 업을 짓지 않는다[但念而未作]’고 설명했다. 하지만 별경에
대해서는 ‘각각의 대상을 조건으로 하여[則別別緣境] 선업과 악업을 짓는 마
음[作善惡業之心也]’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비유로 설명한 바와 같이 변행은
운영체제처럼 항상 작용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심층심리라면 별경은 각기
다른 대상에 대응하여 작용하며 업으로 표출되는 작용이라는 것이다.
별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들 다섯 가지 마음작용은 대상이 각
기 다르기 때문이다. 『유식삼십송』에 따르면 별경을 ‘소연사부동所緣事不
同’이라고 했다. 마음이 작용하는 대상[所緣]이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마
치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처럼 구체적인 대상에 대응하여 작동하는 특
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마이크는 소리를 대상으로 작동하고, 카메라는
빛을 대상으로 작동하고, 자판은 입력하는 손가락에 대응하여 작동한다.
카메라가 음성을 담지 못하고, 마이크가 이미지를 담지 못하는 것과 같이
별경심소 역시 각각 자신에게 배대된 대상에만 작동하는 특징을 지니고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