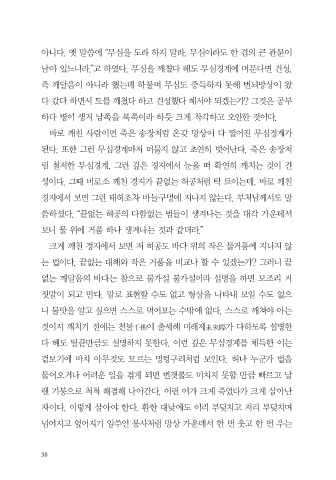Page 40 - 고경 - 2021년 1월호 Vol. 93
P. 40
아니다. 옛 말씀에 “무심을 도라 하지 말라. 무심이라도 한 겹의 큰 관문이
남아 있느니라.”고 하였다. 무심을 깨쳤다 해도 무심경계에 머문다면 견성,
즉 깨달음이 아니라 했는데 하물며 무심도 증득하지 못해 번뇌망상이 왔
다 갔다 하면서 도를 깨쳤다 하고 견성했다 해서야 되겠는가? 그것은 공부
하다 병이 생겨 남쪽을 북쪽이라 하듯 크게 착각하고 오인한 것이다.
바로 깨친 사람이면 죽은 송장처럼 온갖 망상이 다 떨어진 무심경계가
된다. 또한 그런 무심경계마저 머물지 않고 초연히 벗어난다. 죽은 송장처
럼 철저한 무심경계, 그런 깊은 경지에서 눈을 떠 확연히 깨치는 것이 견
성이다. 그때 비로소 깨친 경지가 끝없는 허공처럼 탁 트이는데, 바로 깨친
경지에서 보면 그런 태허조차 바늘구멍에 지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도 말
씀하셨다. “끝없는 허공의 다함없는 법들이 생겨나는 것을 대각 가운데서
보니 물 위에 거품 하나 생겨나는 것과 같더라.”
크게 깨친 경지에서 보면 저 허공도 바다 위의 작은 물거품에 지나지 않
는 법이다. 끝없는 대해와 작은 거품을 비교나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끝
없는 깨달음의 바다는 참으로 불가설 불가설이라 설명을 하면 모조리 거
짓말이 되고 만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형상을 나타내 보일 수도 없으
니 물맛을 알고 싶으면 스스로 먹어보는 수밖에 없다. 스스로 깨쳐야 아는
것이지 깨치기 전에는 천불千佛이 출세해 미래제未來際가 다하도록 설명한
다 해도 털끝만큼도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깊은 무심경계를 체득한 이는
겉보기에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멍텅구리처럼 보인다. 허나 누군가 법을
물어오거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번갯불도 미치지 못할 만큼 빠르고 날
랜 기봉으로 척척 해결해 나아간다. 이런 이가 크게 죽었다가 크게 살아난
자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환한 대낮에도 이리 부딪치고 저리 부딪치며
넘어지고 엎어지기 일쑤인 봉사처럼 망상 가운데서 한 번 웃고 한 번 우는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