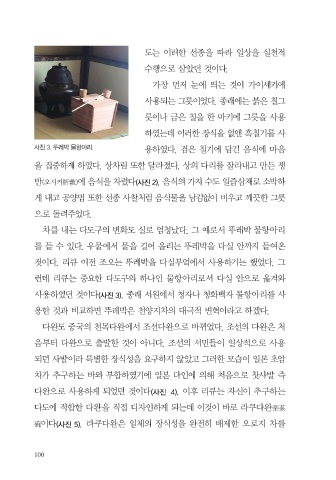Page 102 - 고경 - 2021년 3월호 Vol. 95
P. 102
도는 이러한 선종을 따라 일상을 실천적
수행으로 삼았던 것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가이세키에
사용되는 그릇이었다. 종래에는 붉은 칠그
릇이나 금은 칠을 한 마키에 그릇을 사용
하였는데 이러한 장식을 없앤 흑칠기를 사
사진 3. 뚜레박 물항아리. 용하였다. 검은 칠기에 담긴 음식에 마음
을 집중하게 하였다. 상차림 또한 달라졌다. 상의 다리를 잘라내고 만든 쟁
반(오시키折敷)에 음식을 차렸다(사진 2). 음식의 가지 수도 일즙삼채로 소박하
게 내고 공양법 또한 선종 사찰처럼 음식물을 남김없이 비우고 깨끗한 그릇
으로 돌려주었다.
차를 내는 다도구의 변화도 실로 엄청났다. 그 예로서 뚜레박 물항아리
를 들 수 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뚜레박을 다실 안까지 들여온
것이다. 리큐 이전 조오는 뚜레박을 다실부엌에서 사용하기는 했었다. 그
런데 리큐는 중요한 다도구의 하나인 물항아리로서 다실 안으로 옮겨와
사용하였던 것이다(사진 3). 종래 서원에서 청자나 청화백자 물항아리를 사
용한 것과 비교하면 뚜레박은 천양지차의 대극적 변혁이라고 하겠다.
다완도 중국의 천목다완에서 조선다완으로 바뀌었다. 조선의 다완은 처
음부터 다완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다. 조선의 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
되던 사발이라 특별한 장식성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러한 모습이 일본 초암
차가 추구하는 바와 부합하였기에 일본 다인에 의해 처음으로 찻사발 즉
다완으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다(사진 4). 이후 리큐는 자신이 추구하는
다도에 적합한 다완을 직접 디자인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라쿠다완楽茶
碗이다(사진 5). 라쿠다완은 일체의 장식성을 완전히 배제한 오로지 차를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