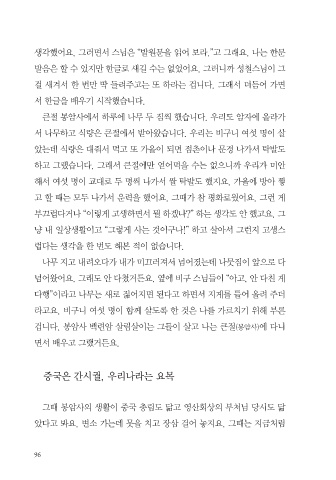Page 98 - 고경 - 2024년 3월호 Vol. 131
P. 98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스님은 “발원문을 읽어 보라.”고 그래요. 나는 한문
발음은 할 수 있지만 한글로 새길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철스님이 그
걸 새겨서 한 번만 딱 들려주고는 또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듬어 가면
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큰절 봉암사에서 하루에 나무 두 짐씩 했습니다. 우리도 암자에 올라가
서 나무하고 식량은 큰절에서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비구니 여섯 명이 살
았는데 식량은 대줘서 먹고 또 가을이 되면 점촌이나 문경 나가서 탁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절에만 얻어먹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미안
해서 여섯 명이 교대로 두 명씩 나가서 쌀 탁발도 했지요. 가을에 방아 찧
고 할 때는 모두 나가서 운력을 했어요. 그때가 참 평화로웠어요. 그런 게
부끄럽다거나 “이렇게 고생하면서 뭘 하겠나?” 하는 생각도 안 했고요. 그
냥 내 일상생활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고 살아서 그런지 고생스
럽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무 지고 내려오다가 내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나뭇짐이 앞으로 다
넘어왔어요. 그래도 안 다쳤거든요. 옆에 비구 스님들이 “아고, 안 다친 게
다행”이라고 나무는 새로 짊어지면 된다고 하면서 지게를 들어 올려 주더
라고요. 비구니 여섯 명이 함께 살도록 한 것은 나를 가르치기 위해 부른
겁니다. 봉암사 백련암 살림살이는 그들이 살고 나는 큰절(봉암사)에 다니
면서 배우고 그랬거든요.
중국은 간시궐, 우리나라는 요목
그때 봉암사의 생활이 중국 총림도 닮고 영산회상의 부처님 당시도 닮
았다고 봐요. 변소 가는데 못을 치고 장삼 걸어 놓지요. 그때는 지금처럼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