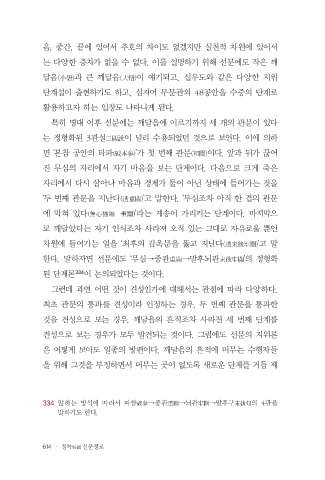Page 614 - 정독 선문정로
P. 614
음, 중간, 끝에 있어서 추호의 차이도 없겠지만 실천적 차원에 있어서
는 다양한 층차가 없을 수 없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선문에도 작은 깨
달음(小悟)과 큰 깨달음(大悟)이 얘기되고, 십우도와 같은 다양한 지위
단계설이 출현하기도 하고, 심지어 무문관의 48공안을 수증의 단계로
활용하고자 하는 입장도 나타나게 된다.
특히 명대 이후 선문에는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세 개의 관문이 있다
는 정형화된 3관설三關說이 널리 수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
면 ‘본참 공안의 타파(破本參)’가 첫 번째 관문(初關)이다. 앞과 뒤가 끊어
진 무심의 자리에서 자기 마음을 보는 단계이다. 다음으로 크게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 마음과 경계가 둘이 아닌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두 번째 관문을 지난다(透重關)’고 말한다. ‘무심조차 아직 한 겹의 관문
에 막혀 있다(無心猶隔一重關)’라는 게송이 가리키는 단계이다. 마지막으
로 깨달았다는 자기 인식조차 사라져 오직 있는 그대로 자유로울 뿐인
차원에 들어가는 일을 ‘최후의 감옥문을 뚫고 지난다(透末後牢關)’고 말
한다. 말하자면 선문에도 ‘무심→중관重關→말후뇌관末後牢關’의 정형화
된 단계론 334 이 논의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어떤 것이 견성인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최초 관문의 통과를 견성이라 인정하는 경우,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을 견성으로 보는 경우, 깨달음의 흔적조차 사라진 세 번째 단계를
견성으로 보는 경우가 모두 발견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선문의 지위론
은 어떻게 보아도 일종의 방편이다. 깨달음의 흔적에 머무는 수행자들
을 위해 그것을 부정하면서 머무는 곳이 없도록 새로운 단계를 거듭 제
334 말하는 방식에 따라서 파참破參→중관重關→뇌관牢關→말후구末後句의 4관을
말하기도 한다.
614 · 정독精讀 선문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