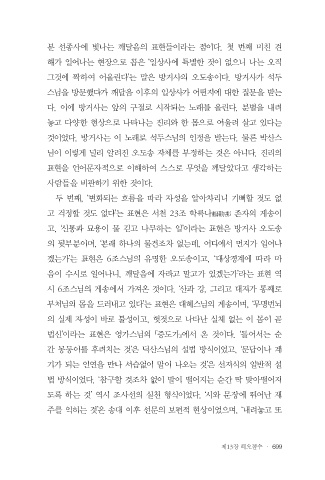Page 699 - 정독 선문정로
P. 699
분 선종사에 빛나는 깨달음의 표현들이라는 점이다. 첫 번째 미친 견
해가 일어나는 현장으로 꼽은 ‘일상사에 특별한 것이 없으니 나는 오직
그것에 짝하여 어울린다’는 말은 방거사의 오도송이다. 방거사가 석두
스님을 방문했다가 깨달음 이후의 일상사가 어떤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
다. 이에 방거사는 앞의 구절로 시작되는 노래를 올린다. 분별을 내려
놓고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진리와 한 몸으로 어울려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방거사는 이 노래로 석두스님의 인정을 받는다. 물론 박산스
님이 이렇게 널리 알려진 오도송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진리의
표현을 언어문자적으로 이해하여 스스로 무엇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변화되는 흐름을 따라 자성을 알아차리니 기뻐할 것도 없
고 걱정할 것도 없다’는 표현은 서천 23조 학륵나鶴勒那 존자의 게송이
고, ‘신통과 묘용이 물 긷고 나무하는 일’이라는 표현은 방거사 오도송
의 뒷부분이며, ‘본래 하나의 물건조차 없는데, 어디에서 먼지가 일어나
겠는가’는 표현은 6조스님의 유명한 오도송이고, ‘대상경계에 따라 마
음이 수시로 일어나니, 깨달음에 자라고 말고가 있겠는가’라는 표현 역
시 6조스님의 게송에서 가져온 것이다. ‘산과 강, 그리고 대지가 통째로
부처님의 몸을 드러내고 있다’는 표현은 대혜스님의 게송이며, ‘무명번뇌
의 실제 자성이 바로 불성이고, 헛것으로 나타난 실체 없는 이 몸이 곧
법신’이라는 표현은 영가스님의 『증도가』에서 온 것이다. ‘들어서는 순
간 몽둥이를 후려치는 것’은 덕산스님의 설법 방식이었고, ‘문답이나 계
기가 되는 인연을 만나 서슴없이 말이 나오는 것’은 선지식의 일반적 설
법 방식이었다. ‘참구할 것조차 없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딱 맞아떨어지
도록 하는 것’ 역시 조사선의 실천 형식이었다. ‘시와 문장에 뛰어난 재
주를 익히는 것’은 송대 이후 선문의 보편적 현상이었으며, ‘내려놓고 또
제13장 해오점수 · 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