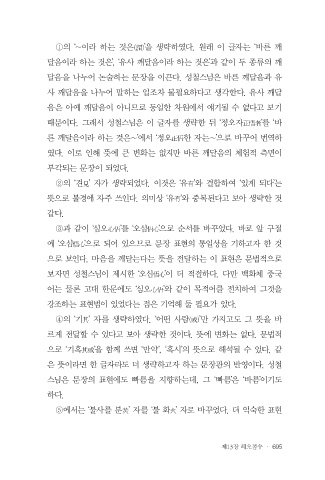Page 695 - 정독 선문정로
P. 695
①의 ‘~이라 하는 것은(謂)’을 생략하였다. 원래 이 글자는 ‘바른 깨
달음이라 하는 것은’, ‘유사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과 같이 두 종류의 깨
달음을 나누어 논술하는 문장을 이끈다. 성철스님은 바른 깨달음과 유
사 깨달음을 나누어 말하는 일조차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유사 깨달
음은 아예 깨달음이 아니므로 동일한 차원에서 얘기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철스님은 이 글자를 생략한 뒤 ‘정오자正悟者’를 ‘바
른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에서 ‘정오正悟한 자는~’으로 바꾸어 번역하
였다. 이로 인해 뜻에 큰 변화는 없지만 바른 깨달음의 체험적 측면이
부각되는 문장이 되었다.
②의 ‘견見’ 자가 생략되었다. 이것은 ‘유有’와 결합하여 ‘있게 되다’는
뜻으로 불경에 자주 쓰인다. 의미상 ‘유有’와 중복된다고 보아 생략한 것
같다.
③과 같이 ‘심오心悟’를 ‘오심悟心’으로 순서를 바꾸었다. 바로 앞 구절
에 ‘오심悟心’으로 되어 있으므로 문장 표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한 것
으로 보인다. 마음을 깨닫는다는 뜻을 전달하는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
보자면 성철스님이 제시한 ‘오심悟心’이 더 적절하다. 다만 백화체 중국
어는 물론 고대 한문에도 ‘심오心悟’와 같이 목적어를 전치하여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법이 있었다는 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④의 ‘기其’ 자를 생략하였다. ‘어떤 사람(或)’만 가지고도 그 뜻을 바
르게 전달할 수 있다고 보아 생략한 것이다. 뜻에 변화는 없다. 문법적
으로 ‘기혹其或’을 함께 쓰면 ‘만약’, ‘혹시’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같
은 뜻이라면 한 글자라도 더 생략하고자 하는 문장관의 반영이다. 성철
스님은 문장의 표현에도 빠름을 지향하는데, 그 ‘빠름’은 ‘바름’이기도
하다.
⑤에서는 ‘불사를 분焚’ 자를 ‘불 화火’ 자로 바꾸었다. 더 익숙한 표현
제13장 해오점수 · 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