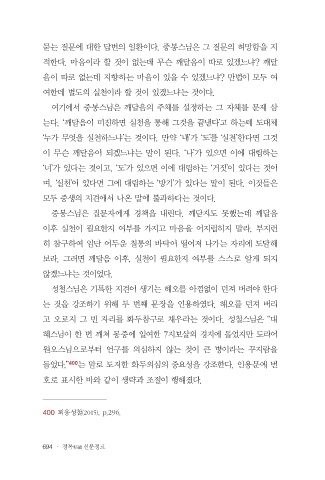Page 694 - 정독 선문정로
P. 694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일환이다. 중봉스님은 그 질문의 허망함을 지
적한다. 마음이라 할 것이 없는데 무슨 깨달음이 따로 있겠느냐? 깨달
음이 따로 없는데 지향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느냐? 만법이 모두 여
여한데 별도의 실천이라 할 것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봉스님은 깨달음의 주체를 설정하는 그 자체를 문제 삼
는다. ‘깨달음이 미진하면 실천을 통해 그것을 끝낸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무엇을 실천하느냐’는 것이다. 만약 ‘내’가 ‘도’를 ‘실천’한다면 그것
이 무슨 깨달음이 되겠느냐는 말이 된다. ‘나’가 있으면 이에 대립하는
‘너’가 있다는 것이고, ‘도’가 있으면 이에 대립하는 ‘거짓’이 있다는 것이
며, ‘실천’이 있다면 그에 대립하는 ‘방기’가 있다는 말이 된다. 이것들은
모두 중생의 지견에서 나온 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중봉스님은 질문자에게 경책을 내린다. 깨닫지도 못했는데 깨달음
이후 실천이 필요한지 여부를 가지고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 부지런
히 참구하여 일단 어두운 칠통의 바닥이 떨어져 나가는 자리에 도달해
보라. 그러면 깨달음 이후, 실천이 필요한지 여부를 스스로 알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성철스님은 기특한 지견이 생기는 해오를 아낌없이 던져 버려야 한다
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두 번째 문장을 인용하였다. 해오를 던져 버리
고 오로지 그 빈 자리를 화두참구로 채우라는 것이다. 성철스님은 “대
혜스님이 한 번 깨쳐 몽중에 일여한 7지보살의 경지에 들었지만 도리어
원오스님으로부터 언구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큰 병이라는 꾸지람을
들었다.” 400 는 말로 도저한 화두의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용문에 번
호로 표시한 바와 같이 생략과 조절이 행해졌다.
400 퇴옹성철(2015), p.296.
694 · 정독精讀 선문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