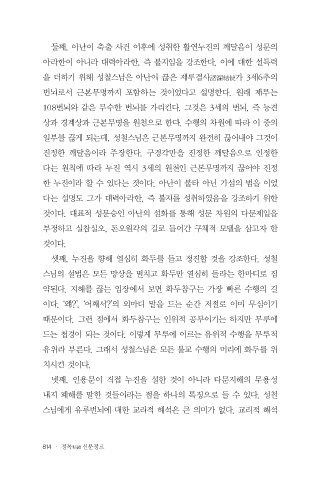Page 814 - 정독 선문정로
P. 814
둘째, 아난이 축출 사건 이후에 성취한 활연누진의 깨달음이 성문의
아라한이 아니라 대력아라한, 즉 불지임을 강조한다. 이에 대한 설득력
을 더하기 위해 성철스님은 아난이 끊은 제루결사諸漏結使가 3세6추의
번뇌로서 근본무명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원래 제루는
108번뇌와 같은 무수한 번뇌를 가리킨다. 그것은 3세의 번뇌, 즉 능견
상과 경계상과 근본무명을 원천으로 한다. 수행의 차원에 따라 이 중의
일부를 끊게 되는데, 성철스님은 근본무명까지 완전히 끊어내야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 주장한다. 구경각만을 진정한 깨달음으로 인정한
다는 원칙에 따라 누진 역시 3세의 원천인 근본무명까지 끊어야 진정
한 누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난이 불타 아닌 가섭의 법을 이었
다는 설명도 그가 대력아라한, 즉 불지를 성취하였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 성문승인 아난의 설화를 통해 성문 차원의 다문제일을
부정하고 실참실오, 돈오원각의 길로 들어간 구체적 모델을 삼고자 한
것이다.
셋째, 누진을 향해 열심히 화두를 들고 정진할 것을 강조한다. 성철
스님의 설법은 모든 망상을 떨치고 화두만 열심히 들라는 한마디로 집
약된다. 지해를 끊는 입장에서 보면 화두참구는 가장 빠른 수행의 길
이다. ‘왜?’, ‘어째서?’의 외마디 말을 드는 순간 저절로 이미 무심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화두참구는 인위적 공부이기는 하지만 무루에
드는 첩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무루에 이르는 유위적 수행을 무루적
유위라 부른다. 그래서 성철스님은 모든 불교 수행의 머리에 화두를 위
치시킨 것이다.
넷째, 인용문이 직접 누진을 설한 것이 아니라 다문지해의 무용성
내지 폐해를 말한 것들이라는 점을 하나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성철
스님에게 유루번뇌에 대한 교리적 해석은 큰 의미가 없다. 교리적 해석
814 · 정독精讀 선문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