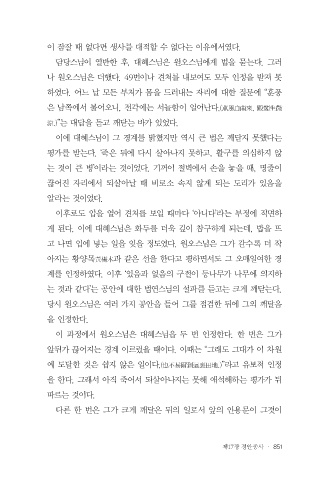Page 851 - 정독 선문정로
P. 851
이 잠잘 때 없다면 생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담당스님이 열반한 후, 대혜스님은 원오스님에게 법을 묻는다. 그러
나 원오스님은 더했다. 49번이나 견처를 내보여도 모두 인정을 받지 못
하였다. 어느 날 모든 부처가 몸을 드러내는 자리에 대한 질문에 “훈풍
은 남쪽에서 불어오니, 전각에는 서늘함이 일어난다. (薰風自南來, 殿閣生微
涼.)”는 대답을 듣고 깨닫는 바가 있었다.
이에 대혜스님이 그 경계를 밝혔지만 역시 큰 법은 깨닫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활구를 의심하지 않
는 것이 큰 병’이라는 것이었다. 기꺼이 절벽에서 손을 놓을 때, 명줄이
끊어진 자리에서 되살아날 때 비로소 속지 않게 되는 도리가 있음을
알라는 것이었다.
이후로도 입을 열어 견처를 보일 때마다 ‘아니다’라는 부정에 직면하
게 된다. 이에 대혜스님은 화두를 더욱 깊이 참구하게 되는데, 밥을 뜨
고 나면 입에 넣는 일을 잊을 정도였다. 원오스님은 그가 갈수록 더 작
아지는 황양목黃楊木과 같은 선을 한다고 평하면서도 그 오매일여한 경
계를 인정하였다. 이후 ‘있음과 없음의 구절이 등나무가 나무에 의지하
는 것과 같다’는 공안에 대한 법연스님의 설파를 듣고는 크게 깨닫는다.
당시 원오스님은 여러 가지 공안을 들어 그를 점검한 뒤에 그의 깨달음
을 인정한다.
이 과정에서 원오스님은 대혜스님을 두 번 인정한다. 한 번은 그가
앞뒤가 끊어지는 경계 이르렀을 때이다. 이때는 “그래도 그대가 이 차원
에 도달한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也不易爾到這裏田地.)”라고 유보적 인정
을 한다. 그래서 아직 죽어서 되살아나지는 못해 애석해하는 평가가 뒤
따르는 것이다.
다른 한 번은 그가 크게 깨달은 뒤의 일로서 앞의 인용문이 그것이
제17장 정안종사 · 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