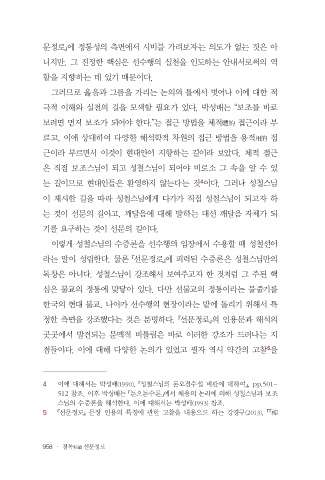Page 958 - 정독 선문정로
P. 958
문정로』에 정통성의 측면에서 시비를 가려보자는 의도가 없는 것은 아
니지만, 그 진정한 핵심은 선수행의 실천을 인도하는 안내서로써의 역
할을 지향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옳음과 그름을 가리는 논의의 틀에서 벗어나 이에 대한 적
극적 이해와 실천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박성배는 “보조를 바로
보려면 먼저 보조가 되어야 한다.”는 접근 방법을 체적體的 접근이라 부
르고, 이에 상대하여 다양한 해석학적 차원의 접근 방법을 용적用的 접
근이라 부르면서 이것이 현대인이 지향하는 길이라 보았다. 체적 접근
은 직접 보조스님이 되고 성철스님이 되어야 비로소 그 속을 알 수 있
4
는 길이므로 현대인들은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그러나 성철스님
이 제시한 길을 따라 성철스님에게 다가가 직접 성철스님이 되고자 하
는 것이 선문의 길이고, 깨달음에 대해 말하는 대신 깨달음 자체가 되
기를 요구하는 것이 선문의 길이다.
이렇게 성철스님의 수증론을 선수행의 입장에서 수용할 때 성철선이
라는 말이 성립한다. 물론 『선문정로』에 피력된 수증론은 성철스님만의
독창은 아니다. 성철스님이 강조해서 보여주고자 한 것처럼 그 주된 핵
심은 불교의 정통에 맞닿아 있다. 다만 선불교의 정통이라는 물줄기를
한국의 현대 불교, 나아가 선수행의 현장이라는 밭에 돌리기 위해서 특
정한 측면을 강조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선문정로』의 인용문과 해석의
곳곳에서 발견되는 문맥적 비틀림은 바로 이러한 강조가 드러나는 지
5
점들이다. 이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필자 역시 약간의 고찰 을
4 이에 대해서는 박성배(1990), 「성철스님의 돈오점수설 비판에 대하여」, pp.501-
512 참조. 이후 박성배는 「돈오돈수론」에서 체용의 논리에 의해 성철스님과 보조
스님의 수증론을 해석한다. 이에 대해서는 박성배(1993) 참조.
5 『선문정로』 문장 인용의 특징에 관한 고찰을 내용으로 하는 강경구(2013), 「『禪
958 · 정독精讀 선문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