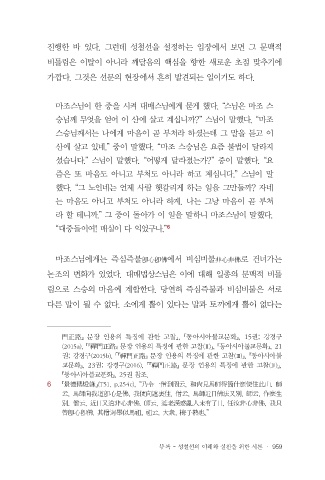Page 959 - 정독 선문정로
P. 959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성철선을 설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문맥적
비틀림은 이탈이 아니라 깨달음의 핵심을 향한 새로운 초점 맞추기에
가깝다. 그것은 선문의 현장에서 흔히 발견되는 일이기도 하다.
마조스님이 한 중을 시켜 대매스님에게 묻게 했다. “스님은 마조 스
승님께 무엇을 얻어 이 산에 살고 계십니까?” 스님이 말했다. “마조
스승님께서는 나에게 마음이 곧 부처라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산에 살고 있네.” 중이 말했다. “마조 스승님은 요즘 불법이 달라지
셨습니다.” 스님이 말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중이 말했다. “요
즘은 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 하고 계십니다.” 스님이 말
했다. “그 노인네는 언제 사람 헷갈리게 하는 일을 그만둘까? 자네
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 하게. 나는 그냥 마음이 곧 부처
라 할 테니까.” 그 중이 돌아가 이 일을 말하니 마조스님이 말했다.
“대중들이여! 매실이 다 익었구나.”
6
마조스님에게는 즉심즉불卽心卽佛에서 비심비불非心非佛로 건너가는
논조의 변화가 있었다. 대매법상스님은 이에 대해 일종의 문맥적 비틀
림으로 스승의 마음에 계합한다. 당연히 즉심즉불과 비심비불은 서로
다른 말이 될 수 없다. 소에게 뿔이 있다는 말과 토끼에게 뿔이 없다는
門正路』 문장 인용의 특징에 관한 고찰」, 『동아시아불교문화』, 15권; 강경구
(2015a), 「『禪門正路』 문장 인용의 특징에 관한 고찰(Ⅱ)」, 『동아시아불교문화』, 21
권; 강경구(2015b), 「『禪門正路』 문장 인용의 특징에 관한 고찰(Ⅲ)」, 『동아시아불
교문화』, 23권; 강경구(2016), 「『禪門正路』 문장 인용의 특징에 관한 고찰(Ⅳ)」,
『동아시아불교문화』, 25권 참조.
6 『景德傳燈錄』(T51, p.254c), “乃令一僧到問云, 和尙見馬師得箇什麼便住此山. 師
云, 馬師向我道卽心是佛, 我便向遮裏住. 僧云, 馬師近日佛法又別. 師云, 作麼生
別. 僧云, 近日又道非心非佛. 師云, 遮老漢惑亂人未有了日, 任汝非心非佛, 我只
管卽心卽佛. 其僧迴舉似馬祖, 祖云, 大衆, 梅子熟也.”
부록 - 성철선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시론 · 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