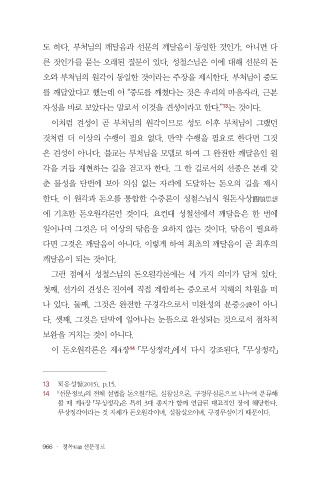Page 966 - 정독 선문정로
P. 966
도 하다. 부처님의 깨달음과 선문의 깨달음이 동일한 것인가, 아니면 다
른 것인가를 묻는 오래된 질문이 있다. 성철스님은 이에 대해 선문의 돈
오와 부처님의 원각이 동일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시한다. 부처님이 중도
를 깨달았다고 했는데 이 “중도를 깨쳤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자리, 근본
13
자성을 바로 보았다는 말로서 이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는 것이다.
이처럼 견성이 곧 부처님의 원각이므로 성도 이후 부처님이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의 수행이 필요 없다, 만약 수행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
은 견성이 아니다. 불교는 부처님을 모델로 하여 그 완전한 깨달음인 원
각을 거듭 재현하는 길을 걷고자 한다. 그 한 길로서의 선종은 본래 갖
춘 불성을 단번에 보아 의심 없는 자리에 도달하는 돈오의 길을 제시
한다. 이 원각과 돈오를 통합한 수증론이 성철스님식 원돈사상圓頓思想
에 기초한 돈오원각론인 것이다. 요컨대 성철선에서 깨달음은 한 번에
일어나며 그것은 더 이상의 닦음을 요하지 않는 것이다. 닦음이 필요하
다면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이렇게 하여 최초의 깨달음이 곧 최후의
깨달음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성철스님의 돈오원각론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 선가의 견성은 진여에 직접 계합하는 증오로서 지해의 차원을 떠
나 있다. 둘째, 그것은 완전한 구경각으로서 미완성의 분증分證이 아니
다. 셋째, 그것은 단박에 일어나는 눈뜸으로 완성되는 것으로서 점차적
보완을 거치는 것이 아니다.
이 돈오원각론은 제4장 「무상정각」에서 다시 강조된다. 「무상정각」
14
13 퇴옹성철(2015), p.15.
14 선문정로』의 전체 설법을 돈오원각론, 실참실오론, 구경무심론으로 나누어 분류해
『
볼 때 제4장 「무상정각」은 특히 3대 종지가 함께 언급된 대표적인 장에 해당한다.
무상정각이라는 것 자체가 돈오원각이며, 실참실오이며, 구경무심이기 때문이다.
966 · 정독精讀 선문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