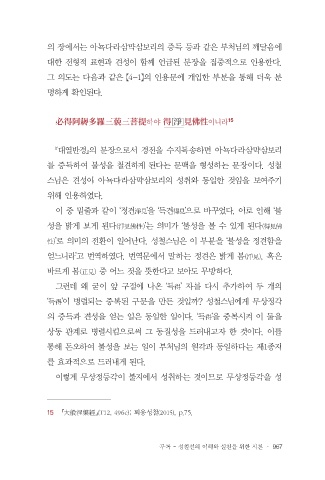Page 967 - 정독 선문정로
P. 967
의 장에서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증득 등과 같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전형적 표현과 견성이 함께 언급된 문장을 집중적으로 인용한다.
그 의도는 다음과 같은 【4-1】의 인용문에 개입한 부분을 통해 더욱 분
명하게 확인된다.
必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하야 得[淨]見佛性이니라 15
『대열반경』의 문장으로서 경전을 수지독송하면 아뇩다라삼먁삼보리
를 증득하여 불성을 철견하게 된다는 문맥을 형성하는 문장이다. 성철
스님은 견성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성취와 동일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인용하였다.
이 중 밑줄과 같이 ‘정견淨見’을 ‘득견得見’으로 바꾸었다. 이로 인해 ‘불
성을 밝게 보게 된다(淨見佛性)’는 의미가 ‘불성을 볼 수 있게 된다(得見佛
性)’로 의미의 전환이 일어난다. 성철스님은 이 부분을 ‘불성을 정견함을
얻느니라’고 번역하였다. 번역문에서 말하는 정견은 밝게 봄(淨見), 혹은
바르게 봄(正見) 중 어느 것을 뜻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런데 왜 굳이 앞 구절에 나온 ‘득得’ 자를 다시 추가하여 두 개의
‘득得’이 병렬되는 중복된 구문을 만든 것일까? 성철스님에게 무상정각
의 증득과 견성을 얻는 일은 동일한 일이다. ‘득得’을 중복시켜 이 둘을
상동 관계로 병렬시킴으로써 그 동질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돈오하여 불성을 보는 일이 부처님의 원각과 동일하다는 제1종지
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게 된다.
이렇게 무상정등각이 불지에서 성취하는 것이므로 무상정등각을 성
『
15 大般涅槃經』(T12, 496c); 퇴옹성철(2015), p.75.
부록 - 성철선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시론 · 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