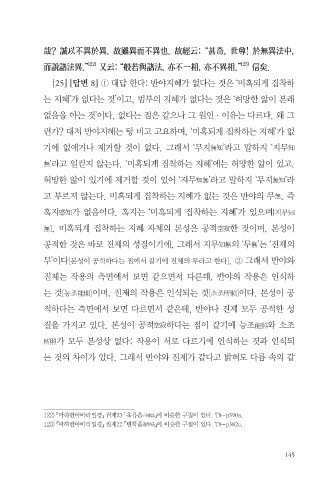Page 147 - 고경 - 2019년 4월호 Vol. 72
P. 147
哉? 誠以不異於異, 故雖異而不異也. 故經云: “甚奇, 世尊! 於無異法中,
123)
122)
而說諸法異.” 又云: “般若與諸法, 亦不一相, 亦不異相.” 信矣.
[25] [답변 8] ① 대답 한다: 반야지혜가 없다는 것은 ‘미혹되게 집착하
는 지혜’가 없다는 것’이고, 범부의 지혜가 없다는 것은 ‘허망한 앎이 본래
없음을 아는 것’이다. 없다는 점은 같으나 그 원인·이유는 다르다. 왜 그
런가? 대저 반야지혜는 텅 비고 고요하며, ‘미혹되게 집착하는 지혜’가 없
기에 없애거나 제거할 것이 없다. 그래서 ‘무지無知’라고 말하지 ‘지무知
無’라고 일컫지 않는다. ‘미혹되게 집착하는 지혜’에는 허망한 앎이 있고,
허망한 앎이 있기에 제거할 것이 있어 ‘지무知無’라고 말하지 ‘무지無知’라
고 부르지 않는다. 미혹되게 집착하는 지혜가 없는 것은 반야의 무無, 즉
혹지惑知가 없음이다. 혹지는 ‘미혹되게 집착하는 지혜’가 있으며[지무知
無], 미혹되게 집착하는 지혜 자체의 본성은 공적空寂한 것이며, 본성이
공적한 것은 바로 진제의 성질이기에, 그래서 지무知無의 ‘무無’는 ‘진제의
무’이다[본성이 공적하다는 점에서 같기에 진제의 무라고 한다]. ② 그래서 반야와
진제는 작용의 측면에서 보면 같으면서 다른데, 반야의 작용은 인식하
는 것[능조能照]이며, 진제의 작용은 인식되는 것[소조所照]이다. 본성이 공
적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르면서 같은데, 반야나 진제 모두 공적한 성
질을 가지고 있다. 본성이 공적空寂하다는 점이 같기에 능조能照와 소조
所照가 모두 본성상 없다; 작용이 서로 다르기에 인식하는 것과 인식되
는 것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반야와 진제가 같다고 밝혀도 다름 속의 같
122) 『마하반야바라밀경』 권제23 「육유품六喩品」에 비슷한 구절이 있다. T8-p390a.
123) 『마하반야바라밀경』 권제22 「변학품遍學品」에 비슷한 구절이 있다. T8-p382c.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