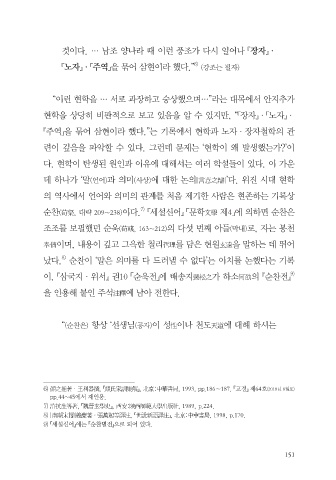Page 153 - 고경 - 2019년 4월호 Vol. 72
P. 153
것이다. … 남조 양나라 때 이런 풍조가 다시 일어나 『장자』·
6)
『노자』·『주역』을 묶어 삼현이라 했다.” (강조는 필자)
“이런 현학을 … 서로 과장하고 숭상했으며…”라는 대목에서 안지추가
현학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장자』·『노자』·
『주역』을 묶어 삼현이라 했다.”는 기록에서 현학과 노자·장자철학의 관
련이 깊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학이 왜 발생했는가?’이
다. 현학이 탄생된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들이 있다. 이 가운
데 하나가 ‘말(언어)과 의미(사상)에 대한 논의[言意之辯]’다. 위진 시대 현학
의 역사에서 언어와 의미의 관계를 처음 제기한 사람은 현존하는 기록상
7)
순찬(荀粲, 대략 209~238)이다. 『세설신어』 「문학文學 제4」에 의하면 순찬은
조조를 보필했던 순욱(荀彧, 163~212)의 다섯 번째 아들(막내)로, 자는 봉천
奉倩이며, 내용이 깊고 그윽한 철리哲理를 담은 현원玄遠을 말하는 데 뛰어
8)
났다. 순찬이 ‘말은 의미를 다 드러낼 수 없다’는 이치를 논했다는 기록
이, 『삼국지·위서』 권10 「순욱전」에 배송지裴松之가 하소何劭의 『순찬전』 9)
을 인용해 붙인 주석注釋에 남아 전한다.
“(순찬은) 항상 ‘선생님(공자)이 성性이나 천도天道에 대해 하시는
6) 顔之推著·王利器撰, 『顔氏家訓集解』, 北京:中華書局, 1993, pp.186∼187. 『고경』 제64호(2018년 8월호)
pp.44~45에서 재인용.
7) 許抗生等著, 『魏晉玄學史』, 西安:陝西師範大學出版社, 1989, p.224.
8) [南朝宋]劉義慶著·張萬起等譯注, 『世說新語譯注』, 北京:中華書局, 1998, p.170.
9) 『세설신어』에는 『순찬별전』으로 되어 있다.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