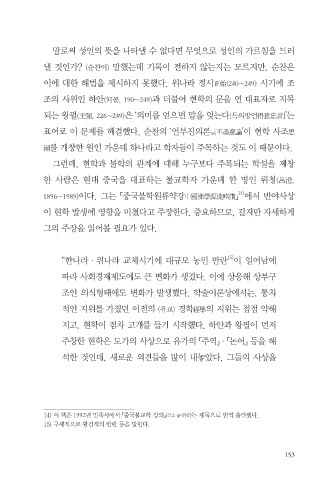Page 155 - 고경 - 2019년 4월호 Vol. 72
P. 155
말로써 성인의 뜻을 나타낼 수 없다면 무엇으로 성인의 가르침을 드러
낼 것인가? (순찬이) 말했는데 기록이 전하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순찬은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위나라 정시正始(240~249) 시기에 조
조의 사위인 하안(何晏, 190~249)과 더불어 현학의 문을 연 대표자로 지목
되는 왕필(王弼, 226~249)은 ‘의미를 얻으면 말을 잊는다[득의망언得意忘言]’는
표어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순찬의 ‘언부진의론言不盡意論’이 현학 사조思
潮를 개창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학자들이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현학과 불학의 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주목되는 학설을 제창
한 사람은 현대 중국을 대표하는 불교학자 가운데 한 명인 뤼청(吕澄,
14)
1896~1989)이다. 그는 『중국불학원류약강中國佛學源流略講』 에서 반야사상
이 현학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중요하므로, 길지만 자세하게
그의 주장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15)
“한나라·위나라 교체시기에 대규모 농민 반란 이 일어남에
따라 사회경제제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이에 상응해 상부구
조인 의식형태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학술이론상에서는, 통치
적인 지위를 가졌던 이전의 (유교) 경학經學의 지위는 점점 약해
지고, 현학이 점차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하안과 왕필이 먼저
주창한 현학은 도가의 사상으로 유가의 『주역』·『논어』 등을 해
석한 것인데, 새로운 의견들을 많이 내놓았다. 그들의 사상을
14) 이 책은 1992년 민족사에서 『중국불교학 강의』(각소 옮김)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됐다.
15) 구체적으로 황건적의 반란 등을 말한다.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