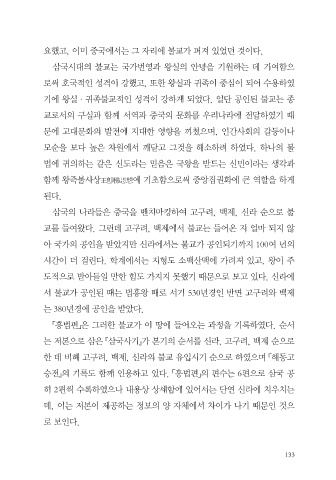Page 135 - 고경 - 2019년 11월호 Vol. 79
P. 135
요했고, 이미 중국에서는 그 자리에 불교가 퍼져 있었던 것이다.
삼국시대의 불교는 국가번영과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데 기여함으
로써 호국적인 성격이 강했고, 또한 왕실과 귀족이 중심이 되어 수용하였
기에 왕실·귀족불교적인 성격이 강하게 되었다. 일단 공인된 불교는 종
교로서의 구실과 함께 서역과 중국의 문화를 우리나라에 전달하였기 때
문에 고대문화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인간사회의 갈등이나
모순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깨닫고 그것을 해소하려 하였다. 하나의 불
법에 귀의하는 같은 신도라는 믿음은 국왕을 받드는 신민이라는 생각과
함께 왕즉불사상王卽佛思想에 기초함으로써 중앙집권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삼국의 나라들은 중국을 벤치마킹하여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불
교를 들여왔다. 그런데 고구려, 백제에서 불교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
아 국가의 공인을 받았지만 신라에서는 불교가 공인되기까지 100여 년의
시간이 더 걸린다. 학계에서는 지형도 소백산맥에 가려져 있고, 왕이 주
도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힘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신라에
서 불교가 공인된 때는 법흥왕 때로 서기 530년경인 반면 고구려와 백제
는 380년경에 공인을 받았다.
「흥법편」은 그러한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는 과정을 기록하였다. 순서
는 저본으로 삼은 『삼국사기』가 본기의 순서를 신라, 고구려, 백제 순으로
한 데 비해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불교 유입시기 순으로 하였으며 『해동고
승전』의 기록도 함께 인용하고 있다. 「흥법편」의 편수는 6편으로 삼국 공
히 2편씩 수록하였으나 내용상 상세함에 있어서는 단연 신라에 치우치는
데, 이는 저본이 제공하는 정보의 양 자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