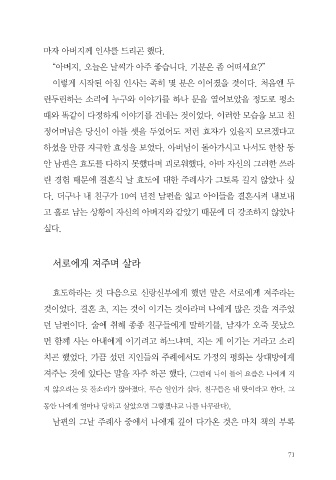Page 73 - 고경 - 2019년 11월호 Vol. 79
P. 73
마자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곤 했다.
“아버지,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기분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시작된 아침 인사는 족히 몇 분은 이어졌을 것이다. 처음엔 두
런두런하는 소리에 누구와 이야기를 하나 문을 열어보았을 정도로 평소
때와 똑같이 다정하게 이야기를 건네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친
정어머님은 당신이 아들 셋을 두었어도 저런 효자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셨을 만큼 지극한 효성을 보였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참 동
안 남편은 효도를 다하지 못했다며 괴로워했다. 아마 자신의 그러한 쓰라
린 경험 때문에 결혼식 날 효도에 대한 주례사가 그토록 길지 않았나 싶
다. 더구나 내 친구가 10여 년전 남편을 잃고 아이들을 결혼시켜 내보내
고 홀로 남는 상황이 자신의 아버지와 같았기 때문에 더 강조하지 않았나
싶다.
서로에게 져주며 살라
효도하라는 것 다음으로 신랑신부에게 했던 말은 서로에게 져주라는
것이었다. 결혼 초,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며 나에게 많은 것을 져주었
던 남편이다. 술에 취해 종종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남자가 오죽 못났으
면 함께 사는 아내에게 이기려고 하느냐며,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소리
치곤 했었다. 가끔 섰던 지인들의 주례에서도 가정의 평화는 상대방에게
져주는 것에 있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다. (그런데 나이 들어 요즘은 나에게 지
지 않으려는 듯 잔소리가 많아졌다. 무슨 일인가 싶다. 친구들은 내 탓이라고 한다. 그
동안 나에게 얼마나 당하고 살았으면 그렇겠냐고 나를 나무란다).
남편의 그날 주례사 중에서 나에게 깊이 다가온 것은 마치 책의 부록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