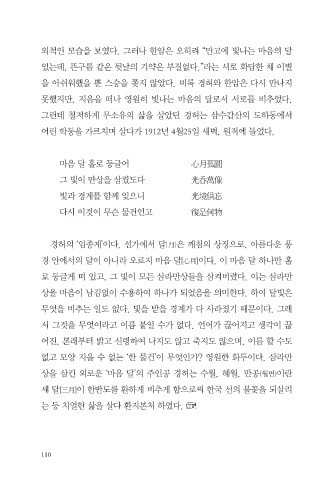Page 112 - 고경 - 2019년 12월호 Vol. 80
P. 112
외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암은 오히려 “만고에 빛나는 마음의 달
있는데, 뜬구름 같은 뒷날의 기약은 부질없다.”라는 시로 화답한 채 이별
을 아쉬워했을 뿐 스승을 쫓지 않았다. 비록 경허와 한암은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지음을 떠나 영원히 빛나는 마음의 달로서 서로를 비추었다.
그런데 철저하게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경허는 삼수갑산의 도하동에서
어린 학동을 가르치며 살다가 1912년 4월25일 새벽, 원적에 들었다.
마음 달 홀로 둥글어 心月孤圓
그 빛이 만상을 삼켰도다 光呑萬像
빛과 경계를 함께 잊으니 光境俱忘
다시 이것이 무슨 물건인고 復是何物
경허의 ‘임종게’이다. 선가에서 달[月]은 깨침의 상징으로, 아름다운 풍
경 안에서의 달이 아니라 오로지 마음 달[心月]이다. 이 마음 달 하나만 홀
로 둥글게 떠 있고, 그 빛이 모든 삼라만상들을 삼켜버렸다. 이는 삼라만
상을 마음이 남김없이 수용하여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여 달빛은
무엇을 비추는 일도 없다. 빛을 받을 경계가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
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다. 언어가 끊어지고 생각이 끊
어진, 본래부터 밝고 신령하여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이름 할 수도
없고 모양 지을 수 없는 ‘한 물건’이 무엇인가? 영원한 화두이다. 삼라만
상을 삼킨 외로운 ‘마음 달’의 주인공 경허는 수월, 혜월, 만공(월면)이란
세 달[三月]이 한반도를 환하게 비추게 함으로써 한국 선의 불꽃을 되살리
는 등 치열한 삶을 살다 환지본처 하였다.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