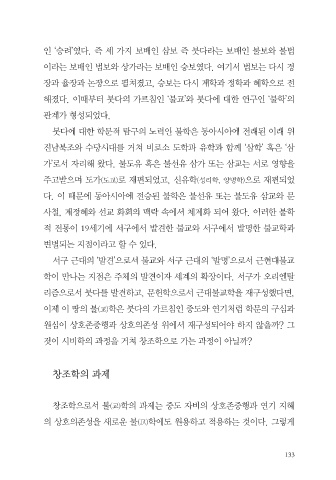Page 135 - 고경 - 2020년 1월호 Vol. 81
P. 135
인 ‘승려’였다. 즉 세 가지 보배인 삼보 즉 붓다라는 보배인 불보와 불법
이라는 보배인 법보와 상가라는 보배인 승보였다. 여기서 법보는 다시 경
장과 율장과 논장으로 펼쳐졌고, 승보는 다시 계학과 정학과 혜학으로 전
해졌다. 이때부터 붓다의 가르침인 ‘불교’와 붓다에 대한 연구인 ‘불학’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붓다에 대한 학문적 탐구의 노력인 불학은 동아시아에 전래된 이래 위
진남북조와 수당시대를 거쳐 비로소 도학과 유학과 함께 ‘삼학’ 혹은 ‘삼
가’로서 자리해 왔다. 불도유 혹은 불선유 삼가 또는 삼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도가(도교)로 재편되었고, 신유학(성리학, 양명학)으로 재편되었
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에 전승된 불학은 불선유 또는 불도유 삼교와 문
사철, 계정혜와 선교 화회의 맥락 속에서 체계화 되어 왔다. 이러한 불학
적 전통이 19세기에 서구에서 발견한 불교와 서구에서 발명한 불교학과
변별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 근대의 ‘발견’으로서 불교와 서구 근대의 ‘발명’으로서 근현대불교
학이 만나는 지점은 주체의 발견이자 세계의 확장이다. 서구가 오리엔탈
리즘으로서 붓다를 발견하고, 문헌학으로서 근대불교학을 재구성했다면,
이제 이 땅의 불(교)학은 붓다의 가르침인 중도와 연기처럼 학문의 구심과
원심이 상호존중행과 상호의존성 위에서 재구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것이 시비학의 과정을 거쳐 창조학으로 가는 과정이 아닐까?
창조학의 과제
창조학으로서 불(교)학의 과제는 중도 자비의 상호존중행과 연기 지혜
의 상호의존성을 새로운 불(교)학에도 원용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