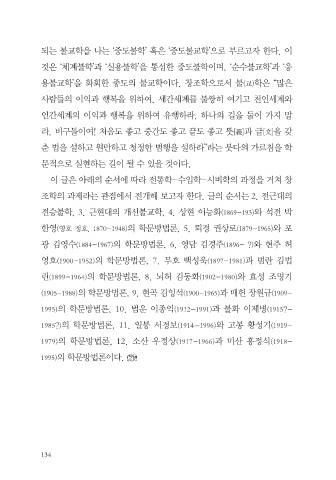Page 136 - 고경 - 2020년 1월호 Vol. 81
P. 136
되는 불교학을 나는 ‘중도불학’ 혹은 ‘중도불교학’으로 부르고자 한다. 이
것은 ‘체계불학’과 ‘실용불학’을 통섭한 중도불학이며, ‘순수불교학’과 ‘응
용불교학’을 화회한 중도의 불교학이다. 창조학으로서 불(교)학은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간세계를 불쌍히 여기고 천인세계와
인간세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유행하라. 하나의 길을 둘이 가지 말
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뜻[義]과 글[文]을 갖
춘 법을 설하고 원만하고 청정한 범행을 설하라”라는 붓다의 가르침을 학
문적으로 실현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전통학-수입학-시비학의 과정을 거쳐 창
조학의 과제라는 관점에서 전개해 보고자 한다. 글의 순서는 2. 전근대의
전승불학, 3. 근현대의 개신불교학, 4. 상현 이능화(1869-193)와 석전 박
한영(영호 정호, 1870-1948)의 학문방법론, 5. 퇴경 권상로(1879-1965)와 포
광 김영수(1884-1967)의 학문방법론, 6. 영담 김경주(1896- ?)와 현주 허
영호(1900-1952)의 학문방법론, 7. 무호 백성욱(1897-1981)과 범란 김법
린(1899-1964)의 학문방법론, 8. 뇌허 김동화(1902-1980)와 효성 조명기
(1905-1988)의 학문방법론, 9. 현곡 김잉석(1900-1965)과 매헌 장원규(1909-
1995)의 학문방법론, 10. 법운 이종익(1912-1991)과 불화 이제병(1915?-
1985?)의 학문방법론, 11. 일붕 서경보(1914~1996)와 고봉 황성기(1919-
1979)의 학문방법론, 12. 소산 우정상(1917-1966)과 미산 홍정식(1918-
1995)의 학문방법론이다.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