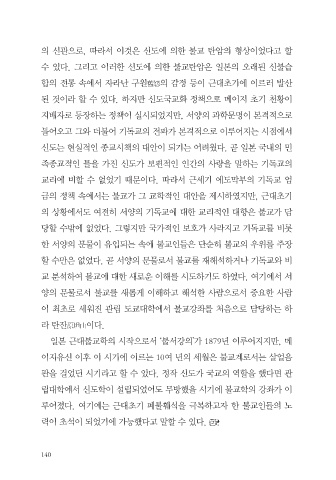Page 142 - 고경 - 2020년 1월호 Vol. 81
P. 142
의 신관으로, 따라서 이것은 신도에 의한 불교 탄압의 형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도에 의한 불교탄압은 일본의 오래된 신불습
합의 전통 속에서 자라난 구원舊怨의 감정 등이 근대초기에 이르러 발산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신도국교화 정책으로 메이지 초기 천황이
지배자로 등장하는 정책이 실시되었지만, 서양의 과학문명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그와 더불어 기독교의 전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신도는 현실적인 종교시책의 대안이 되기는 어려웠다. 곧 일본 국내의 민
족종교적인 틀을 가진 신도가 보편적인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기독교의
교리에 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세기 에도막부의 기독교 엄
금의 정책 속에서는 불교가 그 교학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근대초기
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서양의 기독교에 대한 교리적인 대항은 불교가 담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국가적인 보호가 사라지고 기독교를 비롯
한 서양의 문물이 유입되는 속에 불교인들은 단순히 불교의 우위를 주장
할 수만은 없었다. 곧 서양의 문물로서 불교를 재해석하거나 기독교와 비
교 분석하여 불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서
양의 문물로서 불교를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한 사람으로서 중요한 사람
이 최초로 세워진 관립 도쿄대학에서 불교강좌를 처음으로 담당하는 하
라 탄잔原坦山이다.
일본 근대불교학의 시작으로서 ‘불서강의’가 1879년 이루어지지만, 메
이지유신 이후 이 시기에 이르는 10여 년의 세월은 불교계로서는 살얼음
판을 걸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정작 신도가 국교의 역할을 했다면 관
립대학에서 신도학이 설립되었어도 무방했을 시기에 불교학의 강좌가 이
루어졌다. 여기에는 근대초기 폐불훼석을 극복하고자 한 불교인들의 노
력이 초석이 되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다.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