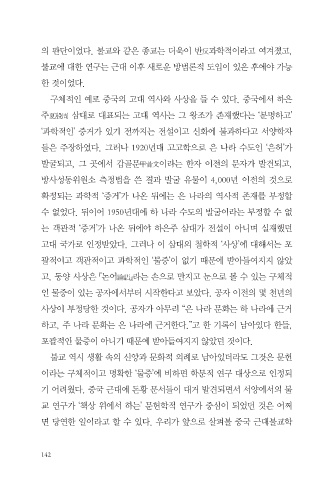Page 144 - 고경 - 2020년 1월호 Vol. 81
P. 144
의 판단이었다. 불교와 같은 종교는 더욱이 반反과학적이라고 여겨졌고,
불교에 대한 연구는 근대 이후 새로운 방법론적 도입이 있은 후에야 가능
한 것이었다.
구체적인 예로 중국의 고대 역사와 사상을 들 수 있다. 중국에서 하은
주夏殷周 삼대로 대표되는 고대 역사는 그 왕조가 존재했다는 ‘분명하고’
‘과학적인’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전설이고 신화에 불과하다고 서양학자
들은 주장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고고학으로 은 나라 수도인 ‘은허’가
발굴되고, 그 곳에서 갑골문甲骨文이라는 한자 이전의 문자가 발견되고,
방사성동위원소 측정법을 쓴 결과 발굴 유물이 4,000년 이전의 것으로
확정되는 과학적 ‘증거’가 나온 뒤에는 은 나라의 역사적 존재를 부정할
수 없었다. 뒤이어 1950년대에 하 나라 수도의 발굴이라는 부정할 수 없
는 객관적 ‘증거’가 나온 뒤에야 하은주 삼대가 전설이 아니며 실재했던
고대 국가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 삼대의 철학적 ‘사상’에 대해서는 포
괄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물증’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
고, 동양 사상은 『논어論語』라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인 물증이 있는 공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았다. 공자 이전의 몇 천년의
사상이 부정당한 것이다. 공자가 아무리 “은 나라 문화는 하 나라에 근거
하고, 주 나라 문화는 은 나라에 근거한다.”고 한 기록이 남아있다 한들,
포괄적인 물증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불교 역시 생활 속의 신앙과 문화적 의례로 남아있더라도 그것은 문헌
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물증’에 비하면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인정되
기 어려웠다. 중국 근대에 돈황 문서들이 대거 발견되면서 서양에서의 불
교 연구가 ‘책상 위에서 하는’ 문헌학적 연구가 중심이 되었던 것은 어쩌
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중국 근대불교학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