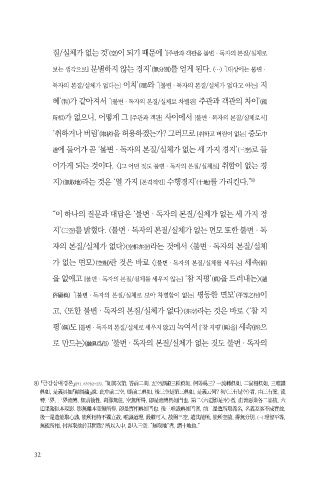Page 32 - 고경 - 2021년 8월호 Vol. 100 - 별책부록
P. 32
질/실체가 없는 것’(空)이 되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을 불변‧독자의 본질/실체로
보는 생각으로] 분별하지 않는 경지’(無分別)를 얻게 된다. (…) ‘[대상에는 불변‧
독자의 본질/실체가 없다는] 이치’(理)와 ‘[불변‧독자의 본질/실체가 없다고 아는] 지
혜’(智)가 같아져서 ‘[불변‧독자의 본질/실체로 차별된] 주관과 객관의 차이’(能
所相)가 없으니, 어떻게 그 [주관과 객관] 사이에서 [불변‧독자의 본질/실체로서]
‘취하거나 버림’(取捨)을 허용하겠는가? 그러므로 [취하고 버림이 없는] 중도中
道에 들어가 곧 ‘불변‧독자의 본질/실체가 없는 세 가지 경지’(三空)로 들
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불변‧독자의 본질/실체로] 취함이 없는 경
지>(無取地)라는 것은 ‘열 가지 [본격적인] 수행경지’(十地)를 가리킨다.” 8)
“이 하나의 질문과 대답은 ‘불변‧독자의 본질/실체가 없는 세 가지 경
지’(三空)를 밝혔다. <불변‧독자의 본질/실체가 없는 면모 또한 불변‧독
자의 본질/실체가 없다>(空相亦空)라는 것에서 <불변‧독자의 본질/실체
가 없는 면모>(空相)란 것은 바로 〈[불변‧독자의 본질/실체를 세우는] 세속(俗)
을 없애고 [불변‧독자의 본질/실체를 세우지 않는] ‘참 지평’(眞)을 드러내는〉(遣
俗顯眞) ‘[불변‧독자의 본질/실체로 보아 차별함이 없는] 평등한 면모’(平等之相)이
고, <또한 불변‧독자의 본질/실체가 없다>(亦空)라는 것은 바로 〈‘참 지
평’(眞)도 [불변‧독자의 본질/실체로 세우지 않고] 녹여서 [‘참 지평’(眞)을] 세속(俗)으
로 만드는〉(融眞爲俗) ‘불변‧독자의 본질/실체가 없는 것도 불변‧독자의
8) 『금강삼매경론』(H1, 639b2~23). “如其次第, 答前二問. 五空卽顯三種眞如, 何等爲三? 一流轉眞如, 二實相眞如, 三唯識
眞如, 是義具如『顯揚論』說. 此中前二空, 卽前二眞如, 後三空是第三眞如, 是義云何? 初<三有是空>者, 由三有愛, 流
轉三界, 三界流轉, 無前後性, 刹那無住, 空無所得, 卽是流轉眞如門也. 第二<六道影是空>者, 由善惡業各二品故, 六
道果報似本現影. 影無離本空無所得, 卽是實相眞如門也. 後三唯識眞如門者, 前二是遣所取義名, 名義互客不成實故,
後一是遣能取心識, 能所相待不獨立故. 唯識道理, 最難可入, 故開三空, 遣其能所, 能所空故, 得無分別. (…) 理智平等,
無能所相, 何容取捨於其間哉? 所以入中, 卽入三空. “無取地”者, 謂十地也.”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