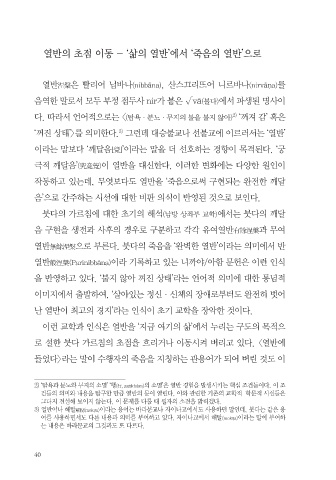Page 42 - 고경 - 2024년 5월호 Vol. 133
P. 42
열반의 초점 이동 - ‘삶의 열반’에서 ‘죽음의 열반’으로
열반涅槃은 빨리어 닙바나(nibbāna), 산스끄리뜨어 니르바나(nirvāṇa)를
음역한 말로서 모두 부정 접두사 nir가 붙은 √vā(불다)에서 파생된 명사이
다. 따라서 언어적으로는 <(탐욕·분노·무지의 불을 불지 않아) ‘꺼져 감’ 혹은
2)
‘꺼진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대승불교나 선불교에 이르러서는 ‘열반’
3)
이라는 말보다 ‘깨달음[覺]’이라는 말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목격된다. ‘궁
극적 깨달음’(究竟覺)이 열반을 대신한다. 이러한 변화에는 다양한 원인이
작동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열반을 ‘죽음으로써 구현되는 완전한 깨달
음’으로 간주하는 시선에 대한 비판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초기의 해석(남방 상좌부 교학)에서는 붓다의 깨달
음 구현을 생전과 사후의 경우로 구분하고 각각 유여열반有餘涅槃과 무여
열반無餘涅槃으로 부른다. 붓다의 죽음을 ‘완벽한 열반’이라는 의미에서 반
열반般涅槃(Parinibbāna)이라 기록하고 있는 니까야/아함 문헌은 이런 인식
을 반영하고 있다. ‘불지 않아 꺼진 상태’라는 언어적 의미에 대한 통념적
이미지에서 출발하여, ‘살아있는 정신·신체의 장애로부터도 완전히 벗어
난 열반이 최고의 경지’라는 인식이 초기 교학을 장악한 것이다.
이런 교학과 인식은 열반을 ‘지금 여기의 삶’에서 누리는 구도의 목적으
로 설한 붓다 가르침의 초점을 흐리거나 이동시켜 버리고 있다. <열반에
들었다>라는 말이 수행자의 죽음을 지칭하는 관용어가 되어 버린 것도 이
2) ‘탐욕과 분노와 무지의 소멸’ ‘행(行, saṅkhāra)의 소멸’은 열반 경험을 발생시키는 핵심 조건들이다. 이 조
건들의 의미와 내용을 탐구한 만큼 열반의 문이 열린다. 이와 관련한 기존의 교학적 학문적 시선들은
그다지 견실해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를 다룰 때 필자의 소견을 밝히겠다.
3) 열반이나 해탈解脫(mokṣa)이라는 용어는 바라문교나 자이나교에서도 사용하던 말인데, 붓다는 같은 용
어를 사용하면서도 다른 내용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자이나교에서 해탈(mokṣa)이라는 말에 부여하
는 내용은 바라문교의 그것과도 또 다르다.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