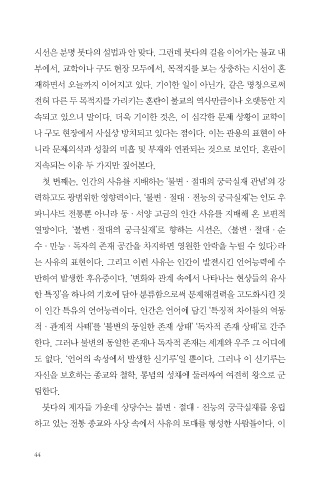Page 46 - 고경 - 2024년 5월호 Vol. 133
P. 46
시선은 분명 붓다의 설법과 안 맞다. 그런데 붓다의 길을 이어가는 불교 내
부에서, 교학이나 구도 현장 모두에서, 목적지를 보는 상충하는 시선이 혼
재하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이한 일이 아닌가. 같은 명칭으로써
전혀 다른 두 목적지를 가리키는 혼란이 불교의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지
속되고 있으니 말이다. 더욱 기이한 것은, 이 심각한 문제 상황이 교학이
나 구도 현장에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관용의 표현이 아
니라 문제의식과 성찰의 미흡 및 부재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혼란이
지속되는 이유 두 가지만 짚어본다.
첫 번째는, 인간의 사유를 지배하는 ‘불변·절대의 궁극실재 관념’의 강
력하고도 광범위한 영향력이다. ‘불변·절대·전능의 궁극실재’는 인도 우
파니샤드 전통뿐 아니라 동·서양 고금의 인간 사유를 지배해 온 보편적
열망이다. ‘불변·절대의 궁극실재’로 향하는 시선은, <불변·절대·순
수·만능·독자의 존재 공간을 차지하면 영원한 안락을 누릴 수 있다>라
는 사유의 표현이다. 그리고 이런 사유는 인간이 발전시킨 언어능력에 수
반하여 발생한 후유증이다. ‘변화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의 유사
한 특징’을 하나의 기호에 담아 분류함으로써 문제해결력을 고도화시킨 것
이 인간 특유의 언어능력이다. 인간은 언어에 담긴 ‘특징적 차이들의 역동
적·관계적 사태’를 ‘불변의 동일한 존재 상태’ ‘독자적 존재 상태’로 간주
한다. 그러나 불변의 동일한 존재나 독자적 존재는 세계와 우주 그 어디에
도 없다. ‘언어의 속성에서 발생한 신기루’일 뿐이다. 그러나 이 신기루는
자신을 보호하는 종교와 철학, 통념의 성채에 둘러싸여 여전히 왕으로 군
림한다.
붓다의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불변·절대·전능의 궁극실재를 옹립
하고 있는 전통 종교와 사상 속에서 사유의 토대를 형성한 사람들이다. 이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