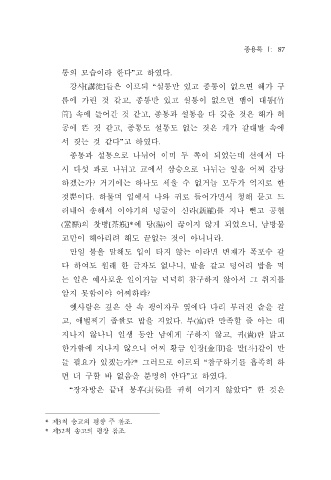Page 87 - 선림고경총서 - 32 - 종용록(상)
P. 87
종용록 上 87
통의 모습이라 한다”고 하였다.
강사[講徒]들은 이르되 “설통만 있고 종통이 없으면 해가 구
름에 가린 것 같고,종통만 있고 설통이 없으면 뱀이 대통[竹
筒]속에 들어간 것 같고,종통과 설통을 다 갖춘 것은 해가 허
공에 뜬 것 같고,종통도 설통도 없는 것은 개가 갈대밭 속에
서 짖는 것 같다”고 하였다.
종통과 설통으로 나뉘어 이미 두 쪽이 되었는데 선에서 다
시 다섯 파로 나뉘고 교에서 삼승으로 나뉘는 일을 어찌 감당
하겠는가?거기에는 하나도 세울 수 없거늘 모두가 억지로 한
것뿐이다.하물며 입에서 나와 귀로 들어가면서 청해 묻고 드
러내어 송해서 이야기의 덩굴이 신라(新羅)를 지나 뻗고 공현
(鞏縣)의 찻병[茶甁]*에 탕(湯)이 끊이지 않게 되었으니,남방불
11)
교만이 헤아리려 해도 끝없는 것이 아니니라.
만일 불을 말해도 입이 타지 않는 이라면 변재가 폭포수 같
다 하여도 원래 한 글자도 없나니,밭을 갈고 덩어리 밥을 먹
는 일은 예사로운 일이거늘 넉넉히 참구하지 않아서 그 취지를
알지 못함이야 어찌하랴?
옛사람은 깊은 산 속 괭이자루 옆에다 다리 부러진 솥을 걸
고,애벌찌기 좁쌀로 밥을 지었다.부(富)란 만족할 줄 아는 데
지나지 않나니 일생 동안 남에게 구하지 않고,귀(貴)란 맑고
한가함에 지나지 않으니 어찌 황금 인장[金印]을 말[斗]같이 만
들 필요가 있겠는가?*그러므로 이르되 “참구하기를 흡족히 하
12)
면 더 구할 바 없음을 분명히 안다”고 하였다.
“장자방은 끝내 봉후(封侯)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한 것은
*제3칙 송고의 평창 주 참조.
*제52칙 송고의 평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