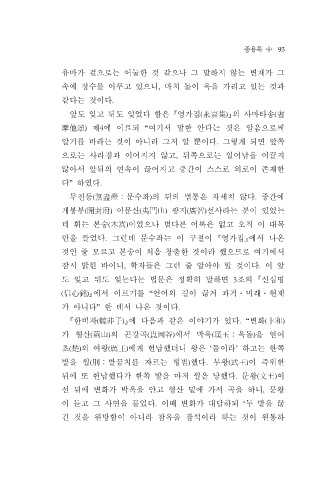Page 93 - 선림고경총서 - 33 - 종용록(중)
P. 93
종용록 中 93
유마가 겉으로는 어눌한 것 같으나 그 말하지 않는 변재가 그
속에 정수를 이루고 있으니,마치 돌이 옥을 가리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앞도 잊고 뒤도 잊었다 함은 영가집(永嘉集)의 사마타송(奢
摩他頌)제4에 이르되 “여기서 말한 안다는 것은 알음으로써
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알 뿐이다.그렇게 되면 앞쪽
으로는 사라짐과 이어지지 않고,뒤쪽으로는 일어남을 이끌지
않아서 앞뒤의 연속이 끊어지고 중간이 스스로 외로이 존재한
다”하였다.
무진등(無盡燈:문수좌)의 뒤의 법통은 자세치 않다.중간에
개봉부(開封府)이문산(夷門山)광지(廣智)선사라는 분이 있었는
데 휘는 본숭(本嵩)이었으나 별다른 어록은 없고 오직 이 대목
만을 들었다.그런데 문수좌는 이 구절이 영가집 에서 나온
것인 줄 모르고 본숭이 처음 창출한 것이라 했으므로 여기에서
잠시 밝힌 바이니,학자들은 그런 줄 알아야 할 것이다.이 앞
도 잊고 뒤도 잊는다는 법문은 정확히 말하면 3조의 신심명
(信心銘)에서 이르기를 “언어의 길이 끊겨 과거․미래․현재
가 아니다”한 데서 나온 것이다.
한비자(韓非子)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변화(卞和)
가 형산(荊山)의 곤강곡(崑岡谷)에서 박옥(璞玉:옥돌)을 얻어
초(楚)의 여왕(厲王)에게 헌납했더니 왕은 ‘돌이라’하고는 한쪽
발을 월(刖:발꿈치를 자르는 형벌)했다.무왕(武王)이 즉위한
뒤에 또 헌납했다가 한쪽 발을 마저 월을 당했다.문왕(文王)이
선 뒤에 변화가 박옥을 안고 형산 밑에 가서 곡을 하니,문왕
이 듣고 그 사연을 물었다.이때 변화가 대답하되 ‘두 발을 끊
긴 것을 원망함이 아니라 참옥을 잡석이라 하는 것이 원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