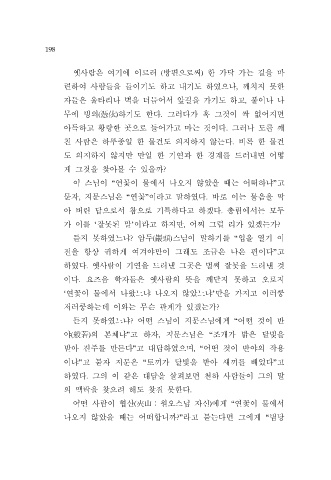Page 198 - 선림고경총서 - 35 - 벽암록(상)
P. 198
198
옛사람은 여기에 이르러 (방편으로써)한 가닥 가는 길을 마
련하여 사람들을 들이기도 하고 내기도 하였으나,깨치지 못한
자들은 울타리나 벽을 더듬어서 앞길을 가기도 하고,풀이나 나
무에 빙의(憑依)하기도 한다.그러다가 혹 그것이 싹 없어지면
아득하고 황량한 곳으로 들어가고 마는 것이다.그러나 도를 깨
친 사람은 하루종일 한 물건도 의지하지 않는다.비록 한 물건
도 의지하지 않지만 만일 한 기연과 한 경계를 드러내면 어떻
게 그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이 스님이 “연꽃이 물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어떠하냐”고
묻자,지문스님은 “연꽃”이라고 말하였다.바로 이는 물음을 막
아 버린 답으로서 참으로 기특하다고 하겠다.총림에서는 모두
가 이를 ‘잘못된 말’이라고 하지만,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듣지 못하였느냐?암두(巖頭)스님이 말하기를 “입을 열기 이
전을 항상 귀하게 여겨야만이 그래도 조금은 나은 편이다”고
하였다.옛사람이 기연을 드러낸 그곳은 벌써 잘못을 드러낸 것
이다.요즈음 학자들은 옛사람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연꽃이 물에서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만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하는데 이와는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듣지 못하였느냐?어떤 스님이 지문스님에게 “어떤 것이 반
야(般若)의 본체냐”고 하자,지문스님은 “조개가 밝은 달빛을
받아 진주를 만든다”고 대답하였으며,“어떤 것이 반야의 작용
이냐”고 묻자 지문은 “토끼가 달빛을 받아 새끼를 배었다”고
하였다.그의 이 같은 대답을 살펴보면 천하 사람들이 그의 말
의 맥락을 찾으려 해도 찾질 못한다.
어떤 사람이 협산(夾山:원오스님 자신)에게 “연꽃이 물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어떠합니까?”라고 묻는다면 그에게 “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