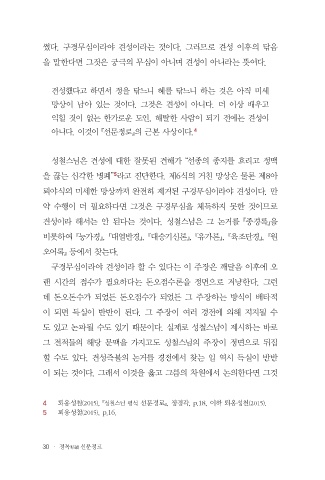Page 30 - 정독 선문정로
P. 30
썼다. 구경무심이라야 견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견성 이후의 닦음
을 말한다면 그것은 궁극의 무심이 아니며 견성이 아니라는 뜻이다.
견성했다고 하면서 정을 닦느니 혜를 닦느니 하는 것은 아직 미세
망상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것은 견성이 아니다. 더 이상 배우고
익힐 것이 없는 한가로운 도인, 해탈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 견성이
아니다. 이것이 『선문정로』의 근본 사상이다. 4
성철스님은 견성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선종의 종지를 흐리고 정맥
을 끊는 심각한 병폐” 라고 진단한다. 제6식의 거친 망상은 물론 제8아
5
뢰야식의 미세한 망상까지 완전히 제거된 구경무심이라야 견성이다. 만
약 수행이 더 필요하다면 그것은 구경무심을 체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견성이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성철스님은 그 논거를 『종경록』을
비롯하여 『능가경』, 『대열반경』, 『대승기신론』, 『유가론』, 『육조단경』, 『원
오어록』 등에서 찾는다.
구경무심이라야 견성이라 할 수 있다는 이 주장은 깨달음 이후에 오
랜 시간의 점수가 필요하다는 돈오점수론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그런
데 돈오돈수가 되었든 돈오점수가 되었든 그 주장하는 방식이 배타적
이 되면 득실이 반반이 된다. 그 주장이 여러 경전에 의해 지지될 수
도 있고 논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철스님이 제시하는 바로
그 전적들의 해당 문맥을 가지고도 성철스님의 주장이 정면으로 뒤집
힐 수도 있다. 견성즉불의 논거를 경전에서 찾는 일 역시 득실이 반반
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논의한다면 그것
4 퇴옹성철(2015), 『성철스님 평석 선문정로』, 장경각, p.18, 이하 퇴옹성철(2015).
5 퇴옹성철(2015), p.16.
30 · 정독精讀 선문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