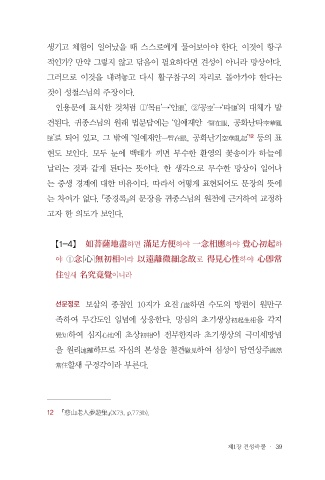Page 39 - 정독 선문정로
P. 39
생기고 체험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것이 항구
적인가? 만약 그렇지 않고 닦음이 필요하다면 견성이 아니라 망상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내려놓고 다시 활구참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성철스님의 주장이다.
인용문에 표시한 것처럼 ①‘목目’→‘안眼’, ②‘공空’→‘타墮’의 대체가 발
견된다. 귀종스님의 원래 법문답에는 ‘일예재안一翳在眼, 공화난타空華亂
12
墜’로 되어 있고, 그 밖에 ‘일예재안一瞖在眼, 공화난기空華亂起’ 등의 표
현도 보인다. 모두 눈에 백태가 끼면 무수한 환영의 꽃송이가 하늘에
날리는 것과 같게 된다는 뜻이다. 한 생각으로 무수한 망상이 일어나
는 중생 경계에 대한 비유이다. 따라서 어떻게 표현되어도 문장의 뜻에
는 차이가 없다. 『종경록』의 문장을 귀종스님의 원전에 근거하여 교정하
고자 한 의도가 보인다.
【1-4】 如菩薩地盡하면 滿足方便하야 一念相應하야 覺心初起하
야 ①念[心]無初相이라 以遠離微細念故로 得見心性하야 心卽常
住일새 名究竟覺이니라
선문정로 보살의 종점인 10지가 요진了盡하면 수도의 방편이 원만구
족하여 무간도인 일념에 상응한다. 망심의 초기생상初起生相을 각지
覺知하여 심지心地에 초상初相이 전무한지라 초기생상의 극미세망념
을 원리遠離하므로 자심의 본성을 철견徹見하여 심성이 담연상주湛然
常住할새 구경각이라 부른다.
『
12 憨山老人夢遊集』(X73, p.773b).
제1장 견성즉불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