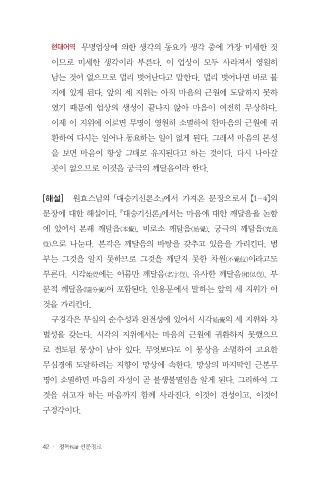Page 42 - 정독 선문정로
P. 42
현대어역 무명업상에 의한 생각의 동요가 생각 중에 가장 미세한 것
이므로 미세한 생각이라 부른다. 이 업상이 모두 사라져서 영원히
남는 것이 없으므로 멀리 벗어난다고 말한다. 멀리 벗어나면 바로 불
지에 있게 된다. 앞의 세 지위는 아직 마음의 근원에 도달하지 못하
였기 때문에 업상의 생성이 끝나지 않아 마음이 여전히 무상하다.
이제 이 지위에 이르면 무명이 영원히 소멸하여 한마음의 근원에 귀
환하여 다시는 일어나 동요하는 일이 없게 된다. 그래서 마음의 본성
을 보면 마음이 항상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나아갈
곳이 없으므로 이것을 궁극의 깨달음이라 한다.
[해설] 원효스님의 『대승기신론소』에서 가져온 문장으로서 【1-4】의
문장에 대한 해설이다. 『대승기신론』에서는 마음에 대한 깨달음을 논함
에 있어서 본래 깨달음(本覺), 비로소 깨달음(始覺), 궁극의 깨달음(究竟
覺)으로 나눈다. 본각은 깨달음의 바탕을 갖추고 있음을 가리킨다. 범
부는 그것을 알지 못하므로 그것을 깨닫지 못한 차원(不覺位)이라고도
부른다. 시각始覺에는 이름만 깨달음(名字覺), 유사한 깨달음(相似覺), 부
분적 깨달음(隨分覺)이 포함된다. 인용문에서 말하는 앞의 세 지위가 이
것을 가리킨다.
구경각은 무심의 순수성과 완전성에 있어서 시각始覺의 세 지위와 차
별성을 갖는다. 시각의 지위에서는 마음의 근원에 귀환하지 못했으므
로 전도된 몽상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이 몽상을 소멸하여 고요한
무심경에 도달하려는 지향이 망상에 속한다. 망상의 마지막인 근본무
명이 소멸하면 마음의 자성이 곧 불생불멸임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그
것을 쉬고자 하는 마음까지 함께 사라진다. 이것이 견성이고, 이것이
구경각이다.
42 · 정독精讀 선문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