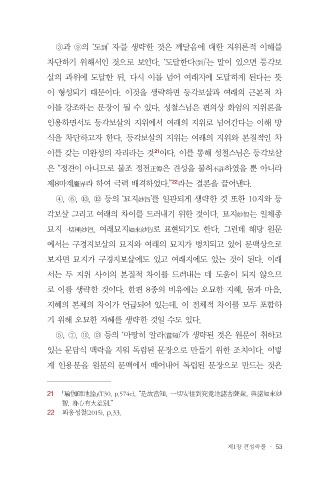Page 53 - 정독 선문정로
P. 53
③과 ⑨의 ‘도到’ 자를 생략한 것은 깨달음에 대한 지위론적 이해를
차단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도달한다(到)’는 말이 있으면 등각보
살의 과위에 도달한 뒤, 다시 이를 넘어 여래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뜻
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생략하면 등각보살과 여래의 근본적 차
이를 강조하는 문장이 될 수 있다. 성철스님은 편의상 화엄의 지위론을
인용하면서도 등각보살의 지위에서 여래의 지위로 넘어간다는 이해 방
식을 차단하고자 한다. 등각보살의 지위는 여래의 지위와 본질적인 차
21
이를 갖는 미완성의 자리라는 것 이다. 이를 통해 성철스님은 등각보살
은 “정견이 아니므로 불조 정전正傳은 견성을 불허不許하였을 뿐 아니라
22
제8마계魔界라 하여 극력 배격하였다.” 라는 결론을 끌어낸다.
④, ⑥, ⑩, ⑫ 등의 ‘묘지妙智’를 일관되게 생략한 것 또한 10지와 등
각보살 그리고 여래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묘지妙智는 일체종
묘지一切種妙智, 여래묘지如來妙智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런데 해당 원문
에서는 구경지보살의 묘지와 여래의 묘지가 병치되고 있어 문맥상으로
보자면 묘지가 구경지보살에도 있고 여래지에도 있는 것이 된다. 이래
서는 두 지위 사이의 본질적 차이를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
로 이를 생략한 것이다. 한편 8종의 비유에는 오묘한 지혜, 몸과 마음,
지혜의 본체의 차이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 전체적 차이를 모두 포함하
기 위해 오묘한 지혜를 생략한 것일 수도 있다.
⑤, ⑦, ⑪, ⑬ 등의 ‘마땅히 알라(當知)’가 생략된 것은 원문이 취하고
있는 문답식 맥락을 지워 독립된 문장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이다. 이렇
게 인용문을 원문의 문맥에서 떼어내어 독립된 문장으로 만드는 것은
21 瑜伽師地論』(T30, p.574c), “是故當知, 一切安住到究竟地諸菩薩衆, 與諸如來妙
『
智, 身心有大差別.”
22 퇴옹성철(2015), p.33.
제1장 견성즉불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