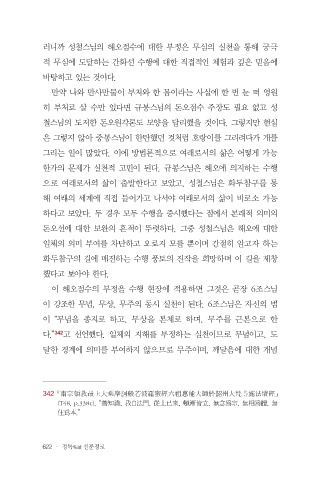Page 622 - 정독 선문정로
P. 622
러니까 성철스님의 해오점수에 대한 부정은 무심의 실천을 통해 궁극
적 무심에 도달하는 간화선 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과 깊은 믿음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나와 만사만물이 부처와 한 몸이라는 사실에 한 번 눈 떠 영원
히 부처로 살 수만 있다면 규봉스님의 돈오점수 주장도 필요 없고 성
철스님의 도저한 돈오원각론도 모양을 달리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
은 그렇지 않아 중봉스님이 한탄했던 것처럼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개를
그리는 일이 많았다. 이에 방법론적으로 여래로서의 삶은 어떻게 가능
한가의 문제가 실천적 고민이 된다. 규봉스님은 해오에 의지하는 수행
으로 여래로서의 삶이 출발한다고 보았고, 성철스님은 화두참구를 통
해 여래의 세계에 직접 들어가고 나서야 여래로서의 삶이 비로소 가능
하다고 보았다. 두 경우 모두 수행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본래적 의미의
돈오선에 대한 보완의 흔적이 뚜렷하다. 그중 성철스님은 해오에 대한
일체의 의미 부여를 차단하고 오로지 모를 뿐이며 간절히 알고자 하는
화두참구의 길에 매진하는 수행 풍토의 진작을 희망하며 이 길을 제창
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 해오점수의 부정을 수행 현장에 적용하면 그것은 곧장 6조스님
이 강조한 무념, 무상, 무주의 동시 실천이 된다. 6조스님은 자신의 법
이 “무념을 종지로 하고, 무상을 본체로 하며, 무주를 근본으로 한
다.” 342 고 선언했다. 일체의 지해를 부정하는 실천이므로 무념이고, 도
달한 경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무주이며, 깨달음에 대한 개념
『
342 南宗頓教最上大乘摩訶般若波羅蜜經六祖惠能大師於韶州大梵寺施法壇經』
(T48, p.338c), “善知識, 我自法門, 從上已來, 頓漸皆立, 無念爲宗, 無相爲體, 無
住爲本.”
622 · 정독精讀 선문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