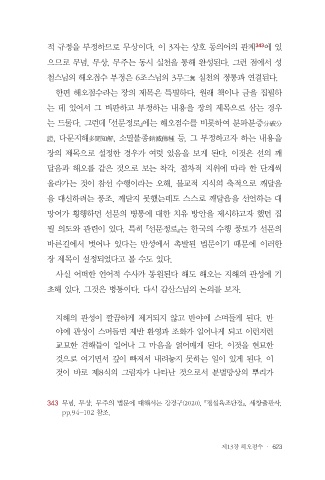Page 623 - 정독 선문정로
P. 623
적 규정을 부정하므로 무상이다. 이 3자는 상호 동의어의 관계 343 에 있
으므로 무념, 무상, 무주는 동시 실천을 통해 완성된다. 그런 점에서 성
철스님의 해오점수 부정은 6조스님의 3무三無 실천의 정통과 연결된다.
한편 해오점수라는 장의 제목은 특별하다. 원래 책이나 글을 집필하
는 데 있어서 그 비판하고 부정하는 내용을 장의 제목으로 삼는 경우
는 드물다. 그런데 『선문정로』에는 해오점수를 비롯하여 분파분증分破分
證, 다문지해多聞知解, 소멸불종銷滅佛種 등, 그 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장의 제목으로 설정한 경우가 여럿 있음을 보게 된다. 이것은 선의 깨
달음과 해오를 같은 것으로 보는 착각, 점차적 지위에 따라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이 참선 수행이라는 오해, 불교적 지식의 축적으로 깨달음
을 대신하려는 풍조, 깨닫지 못했는데도 스스로 깨달음을 선언하는 대
망어가 횡행하던 선문의 병통에 대한 치유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던 집
필 의도와 관련이 있다. 특히 『선문정로』는 한국의 수행 풍토가 선문의
바른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반성에서 촉발된 법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 제목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사실 어떠한 언어적 수사가 동원된다 해도 해오는 지해의 관성에 기
초해 있다. 그것은 병통이다. 다시 감산스님의 논의를 보자.
지해의 관성이 깔끔하게 제거되지 않고 반야에 스며들게 된다. 반
야에 관성이 스며들면 제반 환영과 조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저런
교묘한 견해들이 일어나 그 마음을 얽어매게 된다. 이것을 현묘한
것으로 여기면서 깊이 빠져서 내려놓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된다. 이
것이 바로 제8식의 그림자가 나타난 것으로서 분별망상의 뿌리가
343 무념, 무상, 무주의 법문에 대해서는 강경구(2020), 『평설육조단경』, 세창출판사,
pp.94-102 참조.
제13장 해오점수 · 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