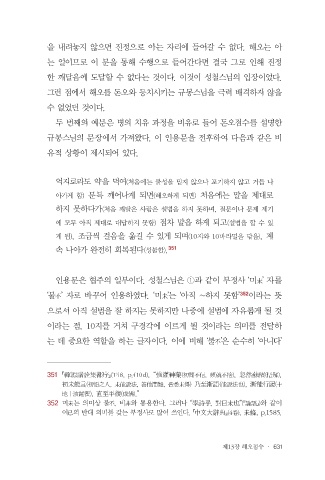Page 631 - 정독 선문정로
P. 631
을 내려놓지 않으면 진정으로 아는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해오는 아
는 일이므로 이 문을 통해 수행으로 들어간다면 결국 그로 인해 진정
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성철스님의 입장이었다.
그런 점에서 해오를 돈오와 등치시키는 규봉스님을 극력 배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두 번째의 예문은 병의 치유 과정을 비유로 들어 돈오점수를 설명한
규봉스님의 문장에서 가져왔다. 이 인용문을 전후하여 다음과 같은 비
유적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억지로라도 약을 먹여(처음에는 불성을 믿지 않으나 포기하지 않고 거듭 나
아가게 함) 문득 깨어나게 되면(해오하게 되면) 처음에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처음 깨달은 사람은 설법을 하지 못하며, 질문이나 문제 제기
에 모두 아직 제대로 대답하지 못함) 점차 말을 하게 되고(설법을 할 수 있
게 됨), 조금씩 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며(10지와 10바라밀을 닦음), 계
속 나아가 완전히 회복된다(성불함).
351
인용문은 협주의 일부이다. 성철스님은 ①과 같이 부정사 ‘미未’ 자를
‘불不’ 자로 바꾸어 인용하였다. ‘미未’는 ‘아직 ~하지 못함’ 352 이라는 뜻
으로서 아직 설법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설법에 자유롭게 될 것
이라는 점, 10지를 거쳐 구경각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자이다. 이에 비해 ‘불不’은 순수히 ‘아니다’
『
351 禪源諸詮集都序』(T48, p.410d), “強灌神藥(初聞不信, 頻就不捨), 忽然蘇醒(悟解),
初未能言(初悟之人, 未能說法, 答他問難, 皆悉未得) 乃至漸語(能說法也), 漸能行履(十
地十波羅蜜), 直至平復(成佛).”
352 미未는 의미상 불不, 비非와 통용한다. 그러나 “學詩乎, 對曰未也”(『論語』)와 같이
이已의 반대 의미를 갖는 부정사로 많이 쓰인다. 『中文大辭典』(4卷), 未條, p.1585.
제13장 해오점수 · 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