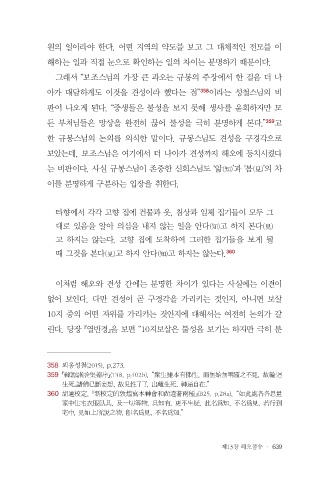Page 639 - 정독 선문정로
P. 639
원의 일이라야 한다. 어떤 지역의 약도를 보고 그 대체적인 전모를 이
해하는 일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일의 차이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조스님의 가장 큰 과오는 규봉의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
아가 대담하게도 이것을 견성이라 했다는 점” 358 이라는 성철스님의 비
판이 나오게 된다. “중생들은 불성을 보지 못해 생사를 윤회하지만 모
든 부처님들은 망상을 완전히 끊어 불성을 극히 분명하게 본다.” 359 고
한 규봉스님의 논의를 의식한 말이다. 규봉스님도 견성을 구경각으로
보았는데, 보조스님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견성까지 해오에 등치시켰다
는 비판이다. 사실 규봉스님이 존중한 신회스님도 ‘앎(知)’과 ‘봄(見)’의 차
이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입장을 취한다.
타향에서 각각 고향 집에 건물과 옷, 침상과 일체 집기들이 모두 그
대로 있음을 알아 의심을 내지 않는 일을 안다(知)고 하지 본다(見)
고 하지는 않는다. 고향 집에 도착하여 그러한 집기들을 보게 될
때 그것을 본다(見)고 하지 안다(知)고 하지는 않는다. 360
이처럼 해오와 견성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다만 견성이 곧 구경각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보살
10지 중의 어떤 지위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갈
린다. 당장 『열반경』을 보면 “10지보살은 불성을 보기는 하지만 극히 분
358 퇴옹성철(2015), p.273.
『
359 禪源諸詮集都序』(T48, p.402b), “衆生雖本有佛性, 而無始無明覆之不見, 故輪迴
生死。諸佛已斷妄想, 故見性了了, 出離生死. 神通自在.”
360 胡適校定, 『新校定的敦煌寫本神會和尙遺著兩種』(B25, p.28a), “如此處各各思量
家中住宅衣服臥具, 及一切等物, 具知有, 更不生疑. 此名爲知, 不名爲見. 若行到
宅中, 見如上所說之物, 卽名爲見, 不名爲知.”
제13장 해오점수 · 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