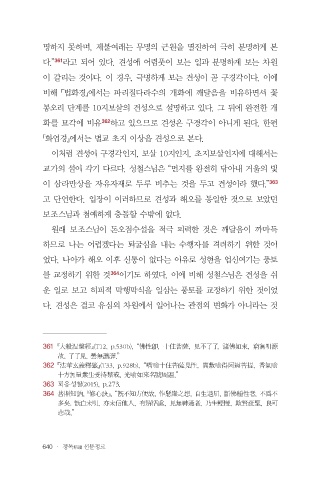Page 640 - 정독 선문정로
P. 640
명하지 못하며, 제불여래는 무명의 근원을 멸진하여 극히 분명하게 본
361
다.” 라고 되어 있다. 견성에 어렴풋이 보는 일과 분명하게 보는 차원
이 갈리는 것이다. 이 경우, 극명하게 보는 견성이 곧 구경각이다. 이에
비해 『법화경』에서는 파리질다라수의 개화에 깨달음을 비유하면서 꽃
봉오리 단계를 10지보살의 견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뒤에 완전한 개
화를 묘각에 비유 362 하고 있으므로 견성은 구경각이 아니게 된다. 한편
『화엄경』에서는 별교 초지 이상을 견성으로 본다.
이처럼 견성이 구경각인지, 보살 10지인지, 초지보살인지에 대해서는
교가의 설이 각기 다르다. 성철스님은 “먼지를 완전히 닦아내 거울의 빛
이 삼라만상을 자유자재로 두루 비추는 것을 두고 견성이라 했다.” 363
고 단언한다. 입장이 이러하므로 견성과 해오를 동일한 것으로 보았던
보조스님과 첨예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다.
원래 보조스님이 돈오점수설을 적극 피력한 것은 깨달음이 까마득
하므로 나는 어렵겠다는 퇴굴심을 내는 수행자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
었다. 나아가 해오 이후 신통이 없다는 이유로 성현을 업신여기는 풍토
를 교정하기 위한 것 364 이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성철스님은 견성을 쉬
운 일로 보고 히피적 막행막식을 일삼는 풍토를 교정하기 위한 것이었
다. 견성은 결코 유심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관점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
361 大般涅槃經』(T12, p.530b), “佛性卽, 十住菩薩, 見不了了, 諸佛如來, 窮無明源
『
故, 了了見. 曇無讖譯.”
『
362 法華玄義釋籤』(T33, p.928b), “嘴喻十住菩薩見性, 開敷喻得阿耨菩提. 香氣喻
十方無量衆生受持禁戒, 光喻如來名號周遍.”
363 퇴옹성철(2015), p.273.
364 普照知訥, 『修心訣』, “旣不知方便故, 作懸崖之想, 自生退屈, 斷佛種性者, 不爲不
多矣. 旣自未明, 亦未信他人, 有解悟處, 見無神通者, 乃生輕慢, 欺賢誑聖, 良可
悲哉.”
640 · 정독精讀 선문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