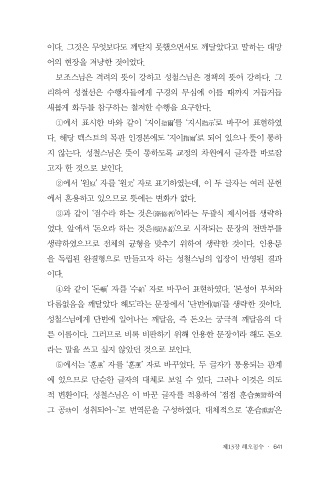Page 641 - 정독 선문정로
P. 641
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깨달았다고 말하는 대망
어의 현장을 겨냥한 것이었다.
보조스님은 격려의 뜻이 강하고 성철스님은 경책의 뜻이 강하다. 그
리하여 성철선은 수행자들에게 구경의 무심에 이를 때까지 거듭거듭
새롭게 화두를 참구하는 철저한 수행을 요구한다.
①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지이指爾’를 ‘지시指示’로 바꾸어 표현하였
다. 해당 텍스트의 목판 인경본에도 ‘지이指爾’로 되어 있으나 뜻이 통하
지 않는다. 성철스님은 뜻이 통하도록 교정의 차원에서 글자를 바로잡
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②에서 ‘원原’ 자를 ‘원元’ 자로 표기하였는데, 이 두 글자는 여러 문헌
에서 혼용하고 있으므로 뜻에는 변화가 없다.
③과 같이 ‘점수라 하는 것은(漸修者)’이라는 두괄식 제시어를 생략하
였다. 앞에서 ‘돈오라 하는 것은(頓悟者)’으로 시작되는 문장의 전반부를
생략하였으므로 전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생략한 것이다. 인용문
을 독립된 완결형으로 만들고자 하는 성철스님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
이다.
④와 같이 ‘돈頓’ 자를 ‘수雖’ 자로 바꾸어 표현하였다. ‘본성이 부처와
다름없음을 깨달았다 해도’라는 문장에서 ‘단번에(頓)’를 생략한 것이다.
성철스님에게 단번에 일어나는 깨달음, 즉 돈오는 궁극적 깨달음의 다
른 이름이다. 그러므로 비록 비판하기 위해 인용한 문장이라 해도 돈오
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에서는 ‘훈熏’ 자를 ‘훈薰’ 자로 바꾸었다. 두 글자가 통용되는 관계
에 있으므로 단순한 글자의 대체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의도
적 변환이다. 성철스님은 이 바꾼 글자를 적용하여 ‘점점 훈습薰習하여
그 공功이 성취되어~’로 번역문을 구성하였다. 대체적으로 ‘훈습熏習’은
제13장 해오점수 · 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