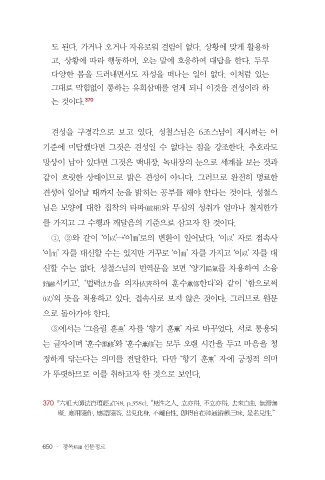Page 650 - 정독 선문정로
P. 650
도 된다. 가거나 오거나 자유로워 걸림이 없다. 상황에 맞게 활용하
고, 상황에 따라 행동하며, 오는 말에 호응하여 대답을 한다. 두루
다양한 몸을 드러내면서도 자성을 떠나는 일이 없다. 이처럼 있는
그대로 막힘없이 통하는 유희삼매를 얻게 되니 이것을 견성이라 하
는 것이다. 370
견성을 구경각으로 보고 있다. 성철스님은 6조스님이 제시하는 이
기준에 미달했다면 그것은 견성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추호라도
망상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백내장, 녹내장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것과
같이 흐릿한 상태이므로 밝은 견성이 아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명료한
견성이 일어날 때까지 눈을 밝히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철스
님은 모양에 대한 집착의 타파(破相)와 무심의 성취가 얼마나 철저한가
를 가지고 그 수행과 깨달음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①, ②와 같이 ‘이以’→‘이而’로의 변환이 일어났다. ‘이以’ 자로 접속사
‘이而’ 자를 대신할 수는 있지만 거꾸로 ‘이而’ 자를 가지고 ‘이以’ 자를 대
신할 수는 없다. 성철스님의 번역문을 보면 ‘양기陽氣를 차용하여 소융
銷融시키고’, ‘법력法力을 의자依資하여 훈수薰修한다’와 같이 ‘함으로써
(以)’의 뜻을 적용하고 있다. 접속사로 보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원문
으로 돌아가야 한다.
③에서는 ‘그을릴 훈熏’ 자를 ‘향기 훈薰’ 자로 바꾸었다. 서로 통용되
는 글자이며 ‘훈수熏修’와 ‘훈수薰修’는 모두 오랜 시간을 두고 마음을 청
정하게 닦는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다만 ‘향기 훈薰’ 자에 긍정적 의미
가 뚜렷하므로 이를 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
370 六祖大師法寶壇經』(T48, p.358c), “見性之人, 立亦得, 不立亦得, 去來自由, 無滯無
礙. 應用隨作, 應語隨答, 普見化身, 不離自性, 卽得自在神通游戲三昧, 是名見性.”
650 · 정독精讀 선문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