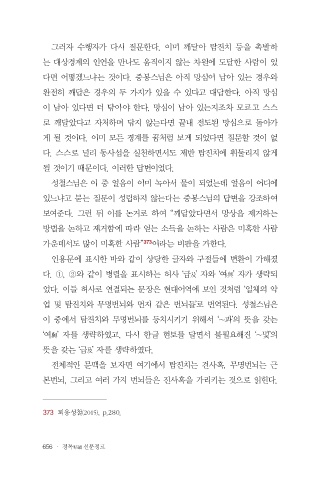Page 656 - 정독 선문정로
P. 656
그러자 수행자가 다시 질문한다. 이미 깨달아 탐진치 등을 촉발하
는 대상경계의 인연을 만나도 움직이지 않는 차원에 도달한 사람이 있
다면 어떻겠느냐는 것이다. 중봉스님은 아직 망심이 남아 있는 경우와
완전히 깨달은 경우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대답한다. 아직 망심
이 남아 있다면 더 닦아야 한다. 망심이 남아 있는지조차 모르고 스스
로 깨달았다고 자처하며 닦지 않는다면 끝내 전도된 망심으로 돌아가
게 될 것이다. 이미 모든 경계를 꿈처럼 보게 되었다면 질문할 것이 없
다. 스스로 널리 동사섭을 실천하면서도 제반 탐진치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답변이었다.
성철스님은 이 중 얼음이 이미 녹아서 물이 되었는데 얼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질문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중봉스님의 답변을 강조하여
보여준다. 그런 뒤 이를 논거로 하여 “깨달았다면서 망상을 제거하는
방법을 논하고 제거함에 따라 얻는 소득을 논하는 사람은 미혹한 사람
가운데서도 많이 미혹한 사람” 이라는 비판을 가한다.
373
인용문에 표시한 바와 같이 상당한 글자와 구절들에 변환이 가해졌
다. ①, ②와 같이 병렬을 표시하는 허사 ‘급及’ 자와 ‘여與’ 자가 생략되
었다. 이들 허사로 연결되는 문장은 현대어역에 보인 것처럼 ‘일체의 악
업 및 탐진치와 무명번뇌와 먼지 같은 번뇌들’로 번역된다. 성철스님은
이 중에서 탐진치와 무명번뇌를 등치시키기 위해서 ‘~과’의 뜻을 갖는
‘여與’ 자를 생략하였고, 다시 한글 현토를 달면서 불필요해진 ‘~및’의
뜻을 갖는 ‘급及’ 자를 생략하였다.
전체적인 문맥을 보자면 여기에서 탐진치는 견사혹, 무명번뇌는 근
본번뇌, 그리고 여러 가지 번뇌들은 진사혹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힌다.
373 퇴옹성철(2015), p.280.
656 · 정독精讀 선문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