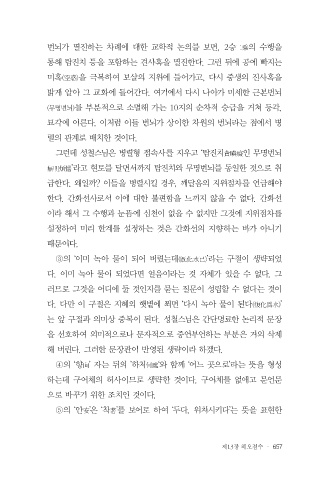Page 657 - 정독 선문정로
P. 657
번뇌가 멸진하는 차례에 대한 교학적 논의를 보면, 2승二乘의 수행을
통해 탐진치 등을 포함하는 견사혹을 멸진한다. 그런 뒤에 공에 빠지는
미혹(空惑)을 극복하여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고, 다시 중생의 진사혹을
밝게 알아 그 교화에 들어간다. 여기에서 다시 나아가 미세한 근본번뇌
(무명번뇌)를 부분적으로 소멸해 가는 10지의 순차적 승급을 거쳐 등각,
묘각에 이른다. 이처럼 이들 번뇌가 상이한 차원의 번뇌라는 점에서 병
렬의 관계로 배치한 것이다.
그런데 성철스님은 병렬형 접속사를 지우고 ‘탐진치貪瞋癡인 무명번뇌
無明煩惱’라고 현토를 달면서까지 탐진치와 무명번뇌를 동일한 것으로 취
급한다. 왜일까? 이들을 병렬시킬 경우, 깨달음의 지위점차를 언급해야
한다. 간화선사로서 이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간화선
이라 해서 그 수행과 눈뜸에 심천이 없을 수 없지만 그것에 지위점차를
설정하여 미리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간화선의 지향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③의 ‘이미 녹아 물이 되어 버렸는데(旣化水已)’라는 구절이 생략되었
다. 이미 녹아 물이 되었다면 얼음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 그
러므로 그것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다. 다만 이 구절은 지혜의 햇볕에 쬐면 ‘다시 녹아 물이 된다(復化爲水)’
는 앞 구절과 의미상 중복이 된다. 성철스님은 간단명료한 논리적 문장
을 선호하여 의미적으로나 문자적으로 중언부언하는 부분은 거의 삭제
해 버린다. 그러한 문장관이 반영된 생략이라 하겠다.
④의 ‘향向’ 자는 뒤의 ’하처何處‘와 함께 ‘어느 곳으로’라는 뜻을 형성
하는데 구어체의 허사이므로 생략한 것이다. 구어체를 없애고 문언문
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⑤의 ‘안安’은 ‘착著’를 보어로 하여 ‘두다, 위치시키다’는 뜻을 표현한
제13장 해오점수 · 657